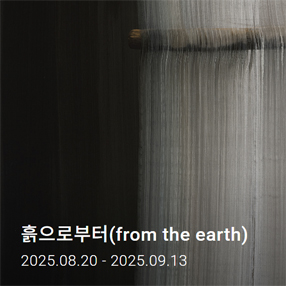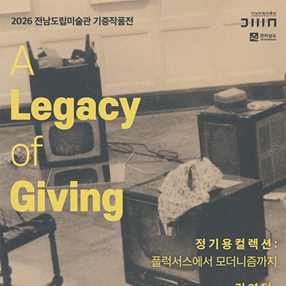본문
-
이상욱
흔적 Trace, 1985,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10x110cm(x2)
이상욱
무제 Untitled, 1979,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00x100cm
이상욱
상황 Situation, 1974,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08x108cm
이상욱
작품 79 Work 79, 1979,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35x52cm
이상욱
작품 79 Work 79, 1979,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35x52cm
이상욱
작품 84 Work 84, 1984,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30x130cm
이상욱
인간만세 Human Eternity, 1977,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91x91cm
이상욱
작품 77 Work 77, 1977, 캔버스에 유채 Oil on canvas, 18x22cm
Press Release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6월 28일(수)부터 7월 29일(토)까지 이상욱(李相昱, 1923-1988) 개인전 《The Centenary》를 연다. 이번 전시는 작고 후 100주년 전시라는 의미를 가지며, 중요한 회화 작품 4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이상욱은 지난 2022년 1월 7일(금)부터 2월 6일(일)까지 학고재에서 열린 한국의 추상회화를 재조명하는 대형 기획전시회 《에이도스(eidos)를 찾아서: 한국 추상화가 7인》에 출품한 작가 중 한 명이다. 1960년대 밀려왔던 서구사조의 거대한 물결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의 정서를 십분 발휘하여 한국적 서정 추상주의를 개척한 이상욱 작가의 위상을 다시 조명한다.
2. 전시 주제
한국의 추상미술은 1957년 앵포르멜이 등장하면서 겹겹이 쌓인 물성을 이용해 전쟁의 폐허와 잔상, 감성적 파토스를 표현했다. 이후 1960년대의 기하추상과 1970년대의 단색화의 흐름을 따라 추상미술이 전개되었으나 한국 추상미술은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추상 미술가들의 특이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흐름 내에서 일필휘지를 바탕으로 한 서체적 추상(calligraphic abstraction)과 서정적 기하추상(lyrical geometric abstraction)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그 특유의 추상 세계를 확립한 이가 이상욱 작가이다. 이상욱은 발묵효과나 여백효과를 가장 미학적으로 구축한다. 일필휘지의 즉흥적인 서체도 화면 전체를 강박적으로 채우지 않는다. 선과 색, 물질성과 투명성, 긴장과 이완의 리듬, 마티에르의 중첩된 질감, 그 속을 가로지르는 질주하는 필력은 이상욱의 그림을 새로운 영역의 추상으로 전환시킨다. 이상욱은 어느 한쪽에 전적으로 기대지 않고 양가적 속성을 역이용하는 회화의 방법론을 채택함으로써, 한국 추상의 새로운 미술사적 흔적과 궤적을 만들었다. 이상욱은 1970년대부터 서체적 추상과 서정적 기하추상 형식을 병용하면서 우리의 자연과 멋과 교감하면서 서정적 추상화의 노선을 다진 동시에 후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지난 세기 한국 모더니스트 회화가의 대표적 주자라 할 수 있는 이상욱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동안 흘러왔던 한국미술사의 단면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이다.
이상욱의 회화적 방법론: 서정적 기하추상과 서체추상
정연심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교수
한국의 추상미술은 1957년 앵포르멜이 등장하면서 겹겹이 쌓인 물성을 이용해 전쟁의 폐허와 잔상, 감성적 파토스를 표현했다. 이후 1960년대의 기하추상과 1970년대의 단색화의 흐름을 따라 추상미술이 전개되었으나 한국 추상미술은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추상 미술가들의 특이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또한 1962년 오리진을 중심으로 기하추상이 형성되었고 모노크롬 추상이 단색화라는 이름으로 수렴되면서 국내에서 추상미술은 다분히 콜렉티브 한 그룹 중심으로 진행되고 전시되었다. 여기서 배제된 추상의 또 다른 양상들은 개별 작가들에 대한 접근으로 제한되면서 제대로 연구되거나 전시되지 못했다. 이러한 흐름 내에서 일필휘지를 바탕으로 한 서체적 추상(calligraphic abstraction)과 서정적 기하추상(lyrical geometric abstraction)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그 특유의 추상 세계를 확립한 이가 이상욱 작가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욱이 표현한 추상은 어떤 세계였으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비평적 고민으로 그 특유의 추상 세계를 구축했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1988년 작고 이후 199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이 개최되었으며, 1997년 일민미술관에서 회고전이 열렸으나 그 이후 이상욱을 대대적으로 다룬 회고전은 개최되지 않았다. 2023년 학고재에서의 개인전이 중요한 이유는, 1997년 이후 깊이 있게 다뤄진 이상욱의 개인전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이상욱을 다룬 전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욱이 이룬 독자적 추상 세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I. 이상욱의 초기 작품
1923년생인 이상욱은 함경남도 함흥에서 유복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사람으로는 파리에서 유학했던 권옥연이 있으며 김흥수, 권영우, 류경채와도 가까이 지냈다. 미술에 뜻을 품고 있었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좌절되다가 1942년에는 일본으로 유학가 가와바타 미술학교(川端画学校) 에서 기초 데생을 배웠다. 하지만 태평양전쟁으로 인해서 1년도 채 안 되어 유학 생활을 그만두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는 고향에서 광복을 맞이하지만 이후 소련이 공산주의를 구축하자 1947년 남하하여 서울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프랑스 유학을 하기 위해 동양외국어대학교 불문학과에 입학했으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단국대학교 정치법학과에 편입했다. 이상욱의 회화는 일본에서의 짧은 유학이 있긴 하나 거의 독자적으로 미술계에 진입하여 이룬 세계이다. 이는 법학을 전공하고 미술을 독자적으로 일궈내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이자 학장까지 지낸 이대원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상욱은 1949년에 시작된 제1회 국전에 항아리를 인 여인을 표현한 <독(甕), Jar>과 <나체, Nude> 두 작품을 출품, 입선하지만 1950년 전쟁이 발발하면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된다. 이후 서울로 다시 돌아와 1955년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화가로서의 독자적 길을 모색한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기 작품들이 지닌 의의라면 이상욱의 ‘방법론’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한 회화적 특징들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이상욱과 동시대 평론가였던 이구열은 초기 국전 시절부터 초기 작품들을 연대기 순서로 설명하는데 ‘현대적 표현주의’, ‘창조적 표현주의’, ‘표현적 변용과 조형적 단순화’ 등과 같은 수식어구를 보여준다. 이상욱의 초기 작품들은 사실상 그가 1970년대와 1980년대 20년 동안 보여준 추상 작품들에 비하면 미학적 조명은 덜 받았지만, 형태가 구조적으로 단순화, 환원적으로 변하고 있는 추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어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서정성을 동반하고 있다. 이상욱의 추상은 단색화 추상처럼 어떤 특징들을 환원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점으로 가면서도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구축적이고 구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기하 추상 작가들의 작품처럼 차갑지도 않아서 보는 사람에게 감정적인 따뜻함이나 정서적 공존과 상응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이원적 특징을 동시에 동반한다.
이상욱이 제6회인 1957년 국전에 출품한 길옆의 여러 모습을 의미하는 <노방군상(路傍群像)>을 출품하는데, 1958년 제7회 국전에 출품한 작품으로 현존하는 <샘터 있는 마을(Village with a Spring)> (캔버스에 유채, 145x90cm)은 1955년에 제작된 <인물(Portrait)>과 <풍경(마을)>/Landscape (Village)>(1958), <해동(解冬), Thawing>(1956)에 비하면 항아리를 머리에 인 여인들이 훨씬 더 단순화되어 있다. 여기서 인체는 기하학적으로 변했으며 무엇보다 형체의 물질성이 완전히 배제된 평면화 되었고, 자코메티(1901-1966)나 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의 인체처럼 신체는 장신화 되었으며 수직구조를 강조한다. 제1회 국전에 출품했던 <독(甕), Jar>이 전통 한복을 입고 아직 전통적인 색채를 띤 모티프라면 <샘터있는 마을>의 여성들은 훨씬 더 ‘현대적’으로 표현되었다. 여기서 ‘현대적’이라는 표현은 인체 구성의 단순성과 추상성을 뜻한다. <샘터있는 마을>의 배경처리 또한 특이한데, 노란색과 갈색의 대비는 다양한 두 색의 톤을 강조함으로써, 배경은 다양한 색면으로 구성된 화면구조를 띤다. 그것은 구조적이지만 직선이 아닌 완만한 언덕처럼 운율처럼 보인다. 여섯 명의 여성들은 흑색의 항아리와 달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여성들의 탈물질화된 수직적 인체는 수평적 구조와 함께 운율을 만드는 듯하다. 이 작품은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 올리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포착한 <해동>에 비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와 구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대에는 달항아리를 모티프로 한 작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미 알려져 있듯이, 한국 미학을 강조한 최순우와 화가 김환기는 ‘달항아리’라는 표현으로 식민사관에서 탈피한 한국 고유의 정서와 백자를 강조하고 있다. 이상욱의 <샘터>와 1950년대 제작으로 추정되는 김환기(1913-1974)의 <여인들과 항아리> (1950년대, 캔버스에 유채, 281.5x567cm)를 서로 비교해보면 서로 화가가 추구하는 바는 각기 달랐으나 당시 화가들이 구축하는 회화적 세계에 대한 고민을 일부 엿볼 수 있다.
이상욱은 <해동>을 1959년 제8회 국전에 출품에 입선하나 이후 그는 국전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서울대와 홍대를 중심으로 한 미술계의 학맥과 보수주의적 아카데미즘에도 선을 그었다. 국전 거부는 당시 전위미술가들이 내던진 예술적 저항이었다. 이들은 보수적 화풍과 장르별 구성의 미술에 반대하면서 1961년 파리 비엔날레나 1963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와 같은 국제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전위작가들, 특히 추상작가들은 보수적 색채의 주제나 매체에 매달리던 국전의 전통적 관행과 거리를 두었다. 이 시기 추상은 유럽미술의 지형도에서 보면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역사적 아방가르드(historical avant-garde)들처럼 전후 한국 미술에서는 유토피아 정신과 전위에 기반을 둔 아방가르드 미술로 인식되었다. 당시 국전을 거부한 이상욱은 1960년 7월에 중앙공보관(Korea Information Center)에서 총 25점을 전시하며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 전시 브로셔에는 국전에 출품했던 작품들을 비롯해 <가로수(Roadside Trees)> 2점, <오월의 作에서(A May Work)>라는 제목의 작품 6점, <유월의 作에서(A June Work)> 3점, <하동(河童), Youngsters at the River)> 등을 포함한다. <하동(河童)>에서 아이들은 평면화되고 단순화된 인체 구조로 구성되었지만 선과 면의 얽힘으로 아이들의 움직임과 역동성을 선적 추상으로 표현한다. 당시 브로셔에 게재된 <가로수>는 이제 구상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선과 면으로 구성된 완전 추상을 구성한다. 1960년 첫 개인전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상욱의<가로수> 도판을 게재하면서 “사(四)철의 가로수는 오고 가는 사철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 아름다운 색깔의 구성을 춘하추동(春夏秋冬)으로 하였다” 고 평한다. 이 작품은 1961년 국전에 대항해서 조선일보사에서 기획한 《현대작가초대전》에 전시했고, 동일한 작품의 판화도 제작해 같이 출품했다.
이상욱은 1957년 바우하우스가 내세운 모던 아트의 미학을 기반으로 “민족 예술의 전통을 계승하여 현대미술의 창조 탐구에 투철할 것”을 주장한 신조형파(Neo-Plastic Art)에도 참여했다. 그는 제2회 전시회에서 앞서 살펴본 <샘터있는 마을>과 풍경화를 보여준 듯하다. 이후 1962년 창립되어 회화, 조각, 디자인의 결합을 시도한 신상회와 창작미술협회 전시에 참여했으며 여기서 이상욱은 예술이 순수한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환경과 일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판화의 미학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II. 판화와 회화의 상보적 관계
이상욱의 전체 작업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 작품은 그동안 초기 작업으로 제대로 분석되거나 연구된 바가 없다. 그리고 판화가로서의 명성에 비해 회화와 그의 판화가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의문을 던져본 적이 없다. 이상욱에게 판화는 어떤 매체였을까. 화가로서의 이상욱, 판화가로서의 이상욱으로 이원화된 시각이 과연 이 작가의 미술적 방법론을 이해하는데 합당한 것일까. 그가 암투병으로 고생하면서도 현대화랑(압구정)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전시한 것은 회화가 아니라 판화였던 점으로 미뤄보면 판화는 그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 같다. 또한 구상에서 추상으로 가는 회화적 과정, 평면적 과정에서 이상욱의 판화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석판화를 실험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후 한국미술사에서 판화는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달리 전위적 젊은 작가들에게는 테크놀로지 기반의 예술로서 뉴미디어에 해당하는 혁신적이고 기술매체 시대의 하이 테크놀로지를 의미했다.
이상욱의 판화 활동은 1958년 이항성이 창립한 한국판화협회 창립전에 참여하고 이후, 1968년에는 김종학, 서승원, 유강렬, 윤명로, 이상욱, 최영림(崔榮林) 등과 함께 한국현대 판화가협회를 창립했다. 한국판화협회를 창립한 이항성은 이상욱과 유강열 등의 판화를 찍어 주기도 했으며, 1971년 강국진이 합정동에 판화교실을 만들었을 때에는 이상욱과 김상유, 김구림, 정찬승 등이 판화를 직접 제작하고 교육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1958년 이상욱은 미국 신시내티미술관(Cincinnati Art Museum)에서 개최된 제5회 현대채색석판화 비엔날레(Fifth International Biennial of Contemporary Color Lithography)에 참여하였다. 이 전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한국판화협회가 결성되던 1958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중앙공보관에서 제1회 협회전이 열리는데 한국전에서는 앞서 살펴본 <하동(河童),
Youngsters at the River>을 전시했다. 「여명기의 우리나라 현대판화」라는 짧은 글에서 이상욱은 다음과 같이 쓴다.
1958년 지금의 신세계미술관(당시의 이름은 동화백화점 화랑)에서 제1회 한국판화협회전을 가지게 된 것이 오늘에 이르러 우리나라 창작판화 활동에 불을 당겨놓은 시기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유강렬, 정규, 박수근을 비롯하여 공예가인 박성삼, 조각가 전상범과 같이 입체 조형을 추구하는 작가도 출품하였거니와 대부분의 출품 작가가 서양화 쪽에 많았던 것이 그 특색이라 하겠다. 임직순, 최영림, 최덕휴, 장리석, 이규호, 이강성, 배륭, 김정자, 차역, 이상욱 등이 당시의 창립 멤버로서 활동하였으며, 작품의 내용도 목판화가 주종을 이루고 스텐실 판법인 실크스크린 몇 점과 지판을 응용한 꼴라그라피 (Collagraphy) 판법에 의한 것이 고작이었다. 이 전람회는 매년 1회 3년을 계속하다 끝나고 말았다.
한국에서 판화가 도입되던 당시 이들 작가들이 사용한 석판화는 주로 오프셋 인쇄기법으로 아연판으로 제작된 석판화로 보이는데 기술적 특성상 세부적인 형태보다는 주로 단순화된 조형성이나 간결함과 같은 평면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기술적 오류나 단점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이들 전위 미술가들은 판화가 가진 특징을 그들의 추상적 모색에 결합시킬 수 있었던 매체적 매개체로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디지털 매체와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목격한 세대는 판화와 전위미술을 결부시키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시기 판화가 가진 위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 국내에서 도록조차 제대로 출판되지 못했던 시대에 판화는 도록 제작이나 포스터, 브로셔 등의 디자인과 제작을 겸한 예술적, 그리고 보조적 성격을 띠었다. 특히, 이상욱에게 추상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대두되는데 이는 오브제(대상)의 재현적 성격을 없애 나가는 과정에서 싹튼 것이었으며, 이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판화라는 새로운 매체와 회화는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띠었다. 그에게 회화적 방법론은 판화의 특징과 함께 변용되고 응용되는 관계였기 때문이다. 이상욱이 당시 ‘새로운 조형’ 이라는 제목으로 미술교과서 작업을 시작한 것도 판화가 가진 “다원적 표현의 영역으로 변화하는 시대” 에 대한 대답으로 1965년도 표지는 어떤 재현적 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절제된 선과 면으로 구성된 절대적 환원적 세계를 보여준다.
III. 서정적 기하추상
이상욱의 작업은 1960년대 중반부터 <점(Point)> (1964, 캔버스에 유채, 60x72cm), <눈(Eye, View Point)>과 같은 원형이나 <독백(Monologue)> 등에서처럼 점, 선, 면의 가장 기본적인 조형요소로 구성된 평면적인 추상성에 도달한다. 1974년 주간경향지에 실린 ‘나의 신작’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작품의 변화를 서술한다.
삼라만상은 결국 한군데로 돌아간다는 주자학적인 만상귀일(萬象歸一)의 사상에 심취했던 때가 있다. 연대로 따져서 1967년경부터 지난해[1973년]까지의 일이다. 그때 나는 무척 단순화된 형태인 크고 둥그런 점과 작고 모가 난 점을 열심히 그렸다.
둥그런 형태와 몇 개의 면으로 구성된 작품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작품에서 점, 선, 면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는 회화적 자율성에 완벽하게 다다르고 있다. 1960년대 작품에서 등장했던 자연을 묘사하던 재현적 특징들은 모두 사라지고 있으나 이상욱이 구축한 환원적 회화 세계에는 1950년대 작업에서처럼 서정성(lyricism)이 존재하고 있다. <부부(A Couple>(1970) 작업에서 붉은색과 초록색은 형태가 묘한 긴장감을 구성하고 있으나 중앙에 있는 초록의 사선은 두 형태의 얽힘에 변화를 가한다. 색 면의 가장자리에는 붉은색과 블랙 아웃라인으로 형태를 규정 시키는 동시에 이탈을 막아 부부로 보이는 두 형태의 긴장과 이완을 안정화 시킨다. 이러한 원형은 삶의 근원이자 기원이며, 모든 만물이 깃들어 있는 가장 근원적인 속성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유형의 이미지지만 무형의 정신과 실체를 비춰주는 비정형의 속성도 함께 지닌다.
또한 다양한 색채와 변주로 존재하는 <독백>은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등장시키는 이상욱의 회화적 방법론 중 하나이다. 1970년에 제작한 <독백>과 1972년에 그린 <독백(Monologue)> (oil on canvas, 83x100 cm)은 이상욱 회화의 가장 근원적인 원형으로 구성된 절제되고 단순화된 추상으로, ‘만상귀일’의 철학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보는 이에 따라서 이것은 달로 보일 수도 있고, 정제된 대화를 담아내는 무형의 이미지로 보이기도 한다. 무정형적인 틀을 부수어 버림으로써, 이러한 이미지들은 형태로 표현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많은 내러티브를 담아내기도 한다. 특히, 이북이 고향으로 실향민이었던 이상욱에게 원형의 이미지는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하거나 묵직한 침묵이나 바위처럼, 또는 자신의 자화상으로 여겨진다. 그가 직접 쓴 글을 인용해보면 원형이 가진 이미지는 재현적 요소를 버렸을 때 추상의 여백이 채워지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다.
나는 작품에서 까닭을 달기 위해 형체를 다듬는 따위의 일을 무척 싫어한다. 그저 답답한 마음에서 화필을 들어 꽃을 만들고, 짜임새를 찾아 헤매면 또 세차고 무겁도록 큰 덩어리를 맞게 된다. 그것은 가끔 나 자신의 자화상으로 보여질 때도 있다. 이러한 감흥은 나를 어색해지게 한다. 사실 나는 내가 그린 둥그러미가 차라리 한 덩어리의 큰 바위처럼 보여 지길 바랄 때도 있다. 이럴 경우는 나를 바위처럼 우직하게 성형했다는 뜻에서 나는 조그만 자존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또한 보름달로 보여질 때도 이태백의 초연했던 인생을 대하는 것 같아 티없는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내가 매력을 느끼는 빛깔은 지난 빨강색. 그 불덩어리같은 색감에 나는 곧잘 도취되는 것이다.
이상욱이 즐겨 사용한 붉은 색은 무겁고 우직한 동시에 불덩어리 같으나 그는 또한 어두운 톤을 즐기는 동시에 흔적들을 그리거나 마티에르의 재질감을 보여준다. 이러한 느낌은 알베르토 부리(1915-1995)의 작품에서 보이는 듯한 전후 추상의 큰 특징이기도 했다. 당시 이상욱은 <망향>을 설명하면서 “고향을 북쪽에 둔 실향민이 아닐지라도 눈물 자국 같은 망향 증상은 누구에게나 있다. 처마 끝에 걸린 달을 바라보며 한동안 잊었던 선친과 친척들의 모습을 일깨워 본다” 고 서술한다. 이상욱은 평소 고전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즐겨했으며 글을 통해서는 묘사적인 설명을 자세히 하지만 그의 회화 작품은 세부적인 묘사들은 제거된 상태의 기하학적이고 환원적인 기본 요소만 남아 있다. 그러나 황규백이나 유영국 등과 같은 신조형파 화가들의 기하추상과는 달리, 이상욱의 추상은 서정적인 표현을 강조하였다. 이승조가 <핵>연작들을 통해서 도시적 느낌의 차가운 옵아트적인 느낌의 기하추상을 모색했던 것과 달리, 이상욱은 표면의 마티에르와 흔적을 남기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서정적인 추상에 도달한다. 겹겹이 쌓인 물감의 묵직한 표면은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만큼 두텁게 처리되었다.
IV. 서체추상과 일필휘지의 즉흥성
일필휘지(一筆揮之)로 빠르고 경쾌하게 그려진 추상, 전통 동양화의 서예를 연상시키는 서체이나 전형적이거나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이고 즉흥적인 액션을 느끼게 하는 추상, 힘차게 표현된 굵은 선의 형상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긴장과 이완”의 연속성, 리듬과 운율을 표현한 짧은 선들의 결렬한 움직임. 1970년대 중반 서정성을 동반한 기하 추상은 점차 서체적 추상으로 바뀌면서 캔버스의 배경은 굵은 서체와 함께 새로운 1979년과 1982년 제작된 <흔적(Trace)>, <작품 79)> (1979) 등으로 표현된다.이러한 특징은 1970년대 다른 한국 작가들에게서는 찾기 힘든 서체적 추상회화로 이어지게 한다. 더욱이 이상욱은 그가 1974년에 제작한 <작품 74(Work 74)>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나의 신작 <작품> 110x 110cm, 유화
.... 65년부터 만상귀일의 시절까지 고심해오던 완당의 서(書)에 관한 나 나름대로의 과제를 새로운 기분 –심기일전-하여 꺼냈다. 완당(阮堂) 김정희의 그 탈속한 서체, 그 난만한 서(書)의 세계를 좀 더 이끌어 나갈 수는 없을까-하는 것이 오랜 나의 숙제였다. 이 <작품>도 그런 테마를 다루고 있다.
완당의 탈속의 서체, 강렬하고 선명한 추사 김정희의 서예는 이상욱의 조형적 세계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으며, 즉흥적인 세계는 그가 초기에 만들어오던 구조와 구축, 환원적 세계와는 이질적인 속성을 띠고 있다. <회화 77 VI>(1977)에서 빗줄기처럼 캔버스 위를 상하좌우로 그어 나가는 필획은 빠르게 내리다가 다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수행적인 그의 몸짓과 함께 공간을 펼쳐 나간다. 이러한 서체적 추상을 제작하면서 작가의 몸은 작품의 일부로서 액션의 한 가운데 위치하며 몸의 움직임에 따라 붓과 서체는 함께 한 몸이 되어 캔버스를 가로지른다. 오늘날 잭슨 폴록의 드리핑 기법의 작품을 보고 작가의 움직임을 상상하듯이, 이상욱의 서체 추상은 부재하는 작가의 몸과 움직임까지도 상상하게 만든다. 이상욱의 말대로, 미술이 실체를 보고 또 분석하는 것이라면 그의 작품은 “여러 가지에서 오는 심상적 실체 이른바 영적인 실체, 이것까지를 자기 마음 속에서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행위를 통털어 미술행위” 라고 규정한다. 당시 이상욱의 서체추상에 대해 김정섭의 설명은 인용할 가치가 있다.
선생님[이상욱]은 1970년대에 인문계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에 비구상 챕터를 만들고 피에르 술라주(Pierre Soulage) 그림으로 대문을 열었다. 전반적으로 술라주의 그림은 어두운 배경에 더 어둡고 넓은...반면 선생님의 작품은 항상 경쾌했다.. 율리우스 비시어(Julius Bissier)의 사인-캘리그래피(sign-calligraphy), 한스 하르통(Hans Hartung)의 제스츄럴 페인팅(gestural painting)을 자주 말씀하셨다. 술잔에 흥분하시면 화폭에 붓을 휘두르는 모습까지 연상시키면서.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의 슬래쉬드 캔버스(slashed canvas)에도 흥취를 표현하였다. 그 이전에는 알베르토 부리(Alberto Burri)를 좋아하셨던 것 같다. 의사였던 부리가 전쟁터에서 총상 입은 병사들의 상처를 붕대로 출혈을 막던 기억으로 캔버스에 마대를 덧붙여서 그린 텍스쳐 페인팅(texture painting)을 선생님은 좋아하셨다.
서양에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서양회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동양회화와 서예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동양의 정신과 선 사상에 영향을 받은 서구 화가들은 동양의 서예나 동양의 전통회화는 묵을 이용하되, 신체의 움직임과 붓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다. 예를 들면 프란츠 클라인(1910-1962)에게 붓은 팔의 연장으로 인체의 확장으로 읽혔다. 안토니 타피에스(1923-2012)나 마크 토비(1890-1976)의 추상 또한 동양화에 영향을 깊이 받았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추상표현주의나 추상회화 자체는 동양화나 선 사상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전개되었다. 특히 서체적 추상은 일본과 미국에서 ‘국제적 동시성’을 띠며 발전, 전개되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도자 위에 일필휘지하는 추상도자도 등장했다. 그러나 전후 미술 분야에서 서체적 추상은 모노크롬 회화나 기하추상, 표현주의적 추상의 경향 내에서 제대로 표출되지 못했지만, 이상욱을 통해 거의 유일하게 완성된 절제미에 도달하게 된다.
V. 생활이 된 미술과 예술적 실천의 확장
회화와 판화, 서정적 기하추상과 서체적 추상의 세계, 이 두 축이 이상욱의 예술적 방법론에서 중요한 실천의 방식이었다면 현실로의 실천은 곧 자신의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상욱에 따르면, “나는 교단에서도 미술은 곧 생활이다 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 생활 자체가 미술의 본 바탕이요. 또한 미술에서 얻어진 차원 높은 감각이 생활에 환원”된다. 이상욱은 휘문고등학교와 홍익대학교 등에서 가르치면서 1960년에는 유네스코(UNESCO) 산하의 InSEA(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Education through Art)의 한국대표로 참여하는 등 국제활동을 넓혀 나갔다. 1960년대는 마닐라에서, 1965년에는 동경에서 InSEA 회의를 참여하는 동시에 그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개인전의 기회 또한 확장해갔다. 1960년 InSEA 국제회의 참여를 위해 마닐라를 갔던 이상욱은 (현 자료는 부재하지만) 본인의 작품과 이항성의 작품으로 2인전을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부인 권정희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쓴다.
부통령 부부의 초대도 있었으니 거의 국가적 대접입니다. ... 가지고간 작품으로 이항성씨와 함께 2인전을 합니다.... 이곳 신문마다 보도되어서 대인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대사관에서 미리 호텔을 잡아 놓고 안내해 주는 것은 고맙지마는 돈은 고스란히 우리가 내는데 그것이 모두 일급호텔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이라오... 이곳 대만에서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전람회를 열기로 했오.... 참 잊어 먹은 얘기가 하나 있군.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김박사라는 사람이 내 그림을 한 점을 사갔소. 돈은 미불로 35불을 받았으니 크게 도움이 됐다오.
홍콩의 한 호텔에서 그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우리나라의 조그마한 시골집이 그리워지기만” 하며 “마치 큰 죄인이 되는 것” 같다고 고백한다. 가난한 나라 출신의 작가가 서구화된 홍콩을 여행하면서 가족들에게 느끼는 죄책감이 역력하게 표현되어 있다. 9월 초 필리핀, 싱가폴, 홍콩을 갔던 이상욱은 9월 30일경에는 동경에 도착해 구보 사다지로(久保貞次郎)라는 일본 평론가를 만나 미술에 대해 논하며, “한국은 겨우 국전이 있지만 이곳은 말할 수 없는 많은 전람회가 열리고 있어서 120개나 되는 미전”이 있다고 부인에게 말한다. 해외 미술의 동향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에게 미술은 환경의 일부로서 생활과 깊은 연관성을 띠는 것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판화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교육에도 헌신적이었다. 환경과 생활로의 확장이라는 예술관을 기반으로 이상욱은 서대문구에서 작업실을 지을 때 “집은 옷이다... 외벽 역시 원석으로 우둔하게, 그러나 아치형의 현관에서 예술인의 체취가 살아나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가 크로키처럼 그린 집은 그의 삶의 확장이나, 작가가 직접 만든 옷과 같은 것으로, 자신의 몸과 정신이 모두 연결된 소우주였다. 그럼에도 그의 삶의 가장 큰 무게를 차지했던 것은 작가로서의 삶이었고, 한국 추상미술을 다채롭게 한 그의 예술사적 기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년 학고재에서 개최되는 이상욱 개인전은 한국 전후에 등장했던 추상미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잊혀진 작가를 새롭게 재발굴하고 재발견하게 한다.
VI. 코다(Coda)
예술적 실천과 회화, 판화 영역으로의 확장에도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이상욱의 그림으로 돌아와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의 추상회화에 담긴 긴 침묵과 대화는 다른 한국 모더니스트들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특이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추상화가들과 달리, 캔버스의 여백을 빼곡하게 채워 나가는 방법을 채택하는 대신, 발묵효과나 여백효과를 가장 미학적으로 구축한다. 일필휘지의 즉흥적인 서체도 화면 전체를 강박적으로 채우지 않는다. 비워지고 채우는 수행적인 과정과 무위의 흔적들은 이상욱 특유의 추상을 다시 살펴보게 하며, 유화 특유의 물질성과 한국화 고유의 투명성이 서로 교차한다. 선과 색, 물질성과 투명성, 긴장과 이완의 리듬, 마티에르의 중첩된 질감, 그 속을 가로지르는 질주하는 필력은 이상욱의 그림을 새로운 영역의 추상으로 전환시킨다. 이상욱은 어느 한쪽에 전적으로 기대지 않고 양가적 속성을 역이용하는 회화의 방법론을 채택함으로써, 한국 추상의 새로운 미술사적 흔적과 궤적을 만들었다.
Fidem Colebat: 서정적 추상화에 숨은 의미
이진명 | 미술비평․미학․철학박사
이상욱(李相昱, 1923-1988) 작가의 서대문 가택에는 언제나 “호현낙선천하지대낙야, 투현질능천하지대병야(好賢樂善天下之大樂也, 妬賢嫉能天下之大病也).”라는 글이 걸려있었다.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선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고, 어진 사람을 투기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못된 일이다.”라는 뜻이다. 바로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 1837-1900)의 소신을 현손(玄孫, 5대손)인 이상욱 작가가 정중하게 다시 쓴 글이었다. 동무 이제마는 조선의학의 새로운 활로를 연 획기적 의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무 이제마는 주희(朱熹, 1120-1200)의 심성론과 수양론을 뛰어넘어 선진시대의 맹자의 사단론에서 사상의학의 진실을 발견한 불세출의 사상가이기도 하다. 함경남도 함흥 출신이다. 집안이 언제부터 함흥에 정착했는지 알 수 없더라도, 시조가 이성계(李成桂, 1335-1392)의 고조인 목조(穆祖) 이안사(李安社, ?-1274)이기 때문에 함흥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욱 작가의 고향 역시 함흥이다. 함흥은 1356년 고려 공민왕 때에 이르러 다시 우리 국토로 환속한 지역이다. 조선시대 초기에 함흥 일대는 여진족과 외적의 침입을 막는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태조 이성계가 임금의 지위에서 물러나 1403년까지 머물렀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상욱 작가의 회화 작품을 보고 서정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작가의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 강인한 남성적 에너지를 만나게 된다. 나는 이 글의 제목을 ‘Fidem Colebat’이라고 지었다. 오비디우스(B.C.43-17)의 『변신이야기』에서 따온 말로 ‘경작된 신념(cultivated faith)’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문화를 평화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팍스 로마나는 로마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이면에 엄청난 투쟁이 숨어있다. 이상욱 작가의 그림은 서정적 추상회화로 알려져 있지만, 작가는 그 서정성을 얻기 위해 실로 엄청난 투쟁과 노고로 일생을 헌신해야 했다.
1950년대 불기 시작한 모더니티의 회화 영역의 거센 바람은 기하학적 추상, 모노크롬 추상, 물성적 추상 등 여러 형식 실험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가들을 떠밀었다. 재능 넘치는 우리 선대 작가들은 거센 바람에 돛을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고, 서구의 형식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논리적 추론이나 소당연의 결과가 아니라 직감이었다. 김환기(1913-1974)ㆍ이마동(1906-1981)ㆍ도상봉(1902-1977)ㆍ이봉상(1916-1970)ㆍ박수근(1914-1965)ㆍ장욱진(1917-1990)부터 유영국(1916-2002)ㆍ이대원(1921-2005)ㆍ권옥연(1923-2011), 그리고 이상욱ㆍ최영림(1916-1985)ㆍ이항성(1919-1997)ㆍ임직순(1921-1996)ㆍ윤명로(1936-)ㆍ전성우(1934-2018)까지 모두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발터 벤야민(1892-1940)이 <새로운 천사(Angelus Novus)>에 비유해서 설명했던 역사 테제를 기억하고 있다. 발터 벤야민은 파울 클레(1879-1940)의 작품 <새로운 천사>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로운 천사>라는 클레의 그림 속에서 천사는 무언가를 또렷이 바라보며 성찰하고 있으면서도 바라보는 그 대상으로부터 막 떠나려고 하는 것만 같다. 천사의 눈은 응시하고 있으며 입은 벌려 있고 날개는 펴졌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천사라는 그림인 것이다. 얼굴은 과거를 향해 돌린다. 우리가 사건의 연쇄를 인지한다면, 천사는 그의 발 앞에 당도하는 난파를 거듭해서 쌓아 올리는 전멸을 바라보는 것이다. 천사는 죽은 자를 살리고 망가진 것을 새로이 만들려고 할 것이나, 천국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 그의 날개를 붙들기에 천사는 그 잔해에 더는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천사 앞에서 잔해의 더미는 높이 쌓여만 가는데, 거센 바람은 과거로 향하는 그의 등을 떠밀어 미래로 나아가게 한다. 이 거센 바람을 우리는 진보라고 부른다.
역사라는 천사 앞에 파괴와 전멸로 인한 과거의 잔해가 하늘 높이 쌓여 가는데도, 천사는 그것을 돕지 못하고 거센 바람에 떠밀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눈동자만은 그 잔해로부터 떠나지 못한다. 우리 작가들 역시 역사의 천사와 같았다. 수천 년 동안 누적되었던 미의식과 예술형식을 뒤로하고 모더니티의 수용이라는 미래로 떠밀렸다. 그러나 눈동자만은 우리의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 이상욱 작가 역시 마찬가지여서 추상미술이라는 국제적 분위기에 동참했지만, 서구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달랐다. 서구 회화와 똑같은 평면회화인데 따뜻한 정서가 체현되어 있는가 하면, 현란한 테크닉과 형식적 완결을 추구하는 서구 회화와 달리 소탈(疏脫)한 여유마저 허용했다.
추상회화의 발명은 20세기 서구 예술의 가장 위대한 성과이다. 재현회화에서 추상회화로 패러다임이 이동했다는 사실은 미술사에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시그니처 회화의 성과에 비견될 정도의 사건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선원근법(linear perspective)과 해부학의 도입은 회화사의 최상의 업적이다. 그런데 추상회화의 발명 역시 그 성과에 결코 못지않다. 추상회화의 씨앗은 이미 터너(1775-1851), 쿠르베(1819-1877), 마네(1832-1883), 세잔(1839-1906), 마티스(1869-1954)의 작품에서 예견되었다. 이후 피카소(1881-1973), 브라크(1882-1963)는 큐비즘이라는 유파를 형성하여 형상과 대상이 인식될 수 없는 경지까지 화면을 몰고 갔다. 큐비즘의 영향은 서구사회 전체를 뒤덮게 되었고, 나중에 선배들마저 그 힘을 받아들여 러시아에서 칸딘스키(1866-1944)가 탄생하는가 하면, 프랑스에서 피카비아(1879-1953)가 초현실주의의 기반을 닦게 된다. 이들은 피카소와 브라크를 뛰어넘어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추상회화와 그에 관한 수많은 변주는 국제적인 예술운동을 태동하기 시작했다. 미래주의, 오르피즘, 신크로미즘(Synchromism), 절대주의, 데 스틸, 구성주의, 레이오니즘(Rayonism)이 유럽 전역에서 나타났고, 다다, 바우하우스, 아트 앵포르멜, 추상표현주의, 옵아트, 제로 그룹, 포스트 페인팅 추상화(Post Painterly Abstraction)가 시류를 타다 명멸했다. 전후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비평가 클레멘트 그린버그(1909-1994)는 추상회화에 포커스를 집약했다. 그린버그는 모더니즘이라는 사유 전반에서 최상의 가치는 추상회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모더니즘은 순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고 주장했다. 조각이나 공예, 연극, 문학과 같은 여타 다른 장르의 영향이 순수하게 제거되어 회화만의 본질로 귀결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캔버스의 형태나 물감의 속성만이 강조되다가 최종적으로 평면성(flatness) 자체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 말부터 일어났던 네오다다와 1960년대 초반에 맹아를 이룬 팝아트가 미술계에 수용되면서 그린버그의 이론은 거부되었고, 회화예술에서 형상과 추상이 병용되기에 이른다. 이후 미니멀리즘, 포스트 미니멀리즘, 개념미술, 신체미술, 대지미술이 주류가 되면서 회화는 쇠퇴기를 맞이하다 1980년대 이르러 독일 신표현주의와 함께 복권한다.
우리나라 작가들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형상에서 형상의 제거, 형상의 제거에서 회화의 본질을 묻는 과정, 본질에서 다시 형상과의 재결합을 추구한 노선, 즉 시간적 논리의 정합성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서구 사회에서 회화는 하나의 회화이다. 그것은 미적 범주의 소산이지 윤리와 하나 될 수 없었다. 서구에서 그 누구도 피카소의 여성편력이나 화가의 내면의 성숙도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와 달랐다. 화가의 내면과 화가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중시했다. 그것은 서류기인(書類其人), 혹은 서여기인(書如其人), 문이재도(文以載道)와 같은 예술 전통과 밀접히 관련한다. 이상욱 작가도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좋은 예술이 있다면 그것은 곧 좋은 인간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예술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인간이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인간이라 함은 자기를 늘 간단없이 재발견하고 갈고 닦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욱 작가는 예술과 인간을 동일시하고 있다. 서구에서도 예술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사상은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뷔퐁 백작(1707-1788)의 사상을 참고할 수 있는데, 그는 “스타일은 그 사람 자체이다(Le style c'est l'homme même).”라고 말했다. 스타일의 어원은 첨필(尖筆)을 뜻하는 스틸루스(stylus)이다. 스타일은 곧 영혼의 관상이라는 뜻이다. 나는 뷔퐁의 위대한 발언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이상욱 작가의 화폭에서 느낄 수 있는 포근하고도 강렬하고 때로는 매서우면서도 총체적으로 안정된 정서는 어디에서 기인할까? 그 정서는 온갖 시련을 다 이겨낸 남성의 여유이자 아버지의 무거움이며, 때로는 거친 파고를 모두 이겨낸 자가 베풀 수 있는 관대한 시선과 관련한다.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 중 황금시대에 관하여 묘사하는 부분에서 저자는 그것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명령도 없이, 믿음과 옳은 것이 구축되었다(spone sua, sine lege fidem rectumque colebat).”라고 쓴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 ‘colebat’는 ‘구축되다’로도 번역되지만 엄밀히 이야기해서 ‘경작되다(cultivate)’라는 뜻이 정확하다. ‘colebat’의 어원은 ‘colere’인데, 이 속에 ‘수확하다(to harvest)’라는 뜻, ‘경작하다(to cultivate)’라는 뜻, ‘숭배하다(to worship)’라는 뜻 외에 ‘기다리다(to wait for)’라는 뜻이 복합적으로 내포된다. 믿음과 옳은 것은 추상적이다. 그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대상으로 변환하여 표현해야 한다. 목초지나 필드를 예로 들 수 있다. 목초지나 필드는 라틴어로 ‘ager’이다. 그런데 목초지를 뜻하는 명사 ‘ager’의 동사는 ‘agere’인바 ‘경작하다’는 뜻 이외에 ‘행동하다’라는 뜻도 지닌다. 고대 로마인에게 목초지나 필드는 결코 낭만적인 뜻이 아니었다. ‘행동해야만 하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즉, 전장(battlefield)을 의미한다. 그 전쟁의 적은 누구인가? 황야 혹은 필드 그 자체이다. 전쟁의 목적은 필드를 지배하는 것이다. 지배(dominate)는 집(domus)으로 환원된다. 집의 주인을 ‘vir’라고 하며, 이는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homo’와 구분되어 성숙한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가 말하는 덕성(德性, virtue)은 집의 주인을 뜻하는 단어 ‘virtus’에서 나왔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덕성은 한 분야의 지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인간의 품격을 뜻하는 덕성이란 지배력을 거치지 않고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은 강인한 남성적 세계이다. 나는 작가의 그림 속에서, 함흥에서 유복하게 자랐지만 시대의 불운 때문에 월남해야만 했던 고향상실,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 의해 부친을 잃은 슬픔,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가장이 감내해야만 했던 생의 무게, 그 모두를 발견하게 된다. 작가의 삶은 한마디로 전장이었다. 그런데 작가는 모든 것을 경작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다 마침내 수확해낸다. 휘문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아 가계를 안정시켰고, 홍익대학교ㆍ상명대학교 등지를 출강하면서 새로운 학문과 정보를 받아들여 갈고닦았다. 1965년 무렵에는 문교부 검정 교과서인 『새로운 조형 1-3』을 집필하기도 했다. 한국현대판화가협회를 리더로서 이끄는가 하면, 수많은 국제전과 비엔날레에 초대되어 새로운 작품을 출품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상욱 작가는 필드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작가는 우리의 풍물과 정경을 연상시키는 서정적 추상화를 1960년대 초반에 확립한다. 고향상실에 관한 아픔과 그것의 기억은 작가에게 가장 커다란 회화적 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주지하듯이 하이데거(1889-1976)는 이 시대를 고향상실(Heimatlosigkeit)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이데거가 철학을 가리켜 고향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향수로 규정하는 것을, 이해한다. 하이데거의 존재 물음 역시 상실된 고향의 회복을 의도하고 있다. 따라서 하이데거의 존재 물음은 상실된 고향의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의도와 연관되며, 이때 우리가 이상욱 작가의 1973년도 작품 <점(Point)>과 1976년도 작품 <망향(望鄕, Nostalgia)>의 창작 의도가 고향의 회복에 있었다고 유추해 보는 것은 타당하다. 이 두 작품은 둥근 원을 중앙에 배치하며 표면의 마티에르는 질박하게 처리되어 있다. 원과 사각의 긴장, 큰 것과 작은 것의 대비가 두드러지면서도 둥근 원은 기하학적인 관념의 그것이 아니라, 마치 달의 형상처럼 자연스러우면서도 포근하다. 달은 고향의 거울이다. 함흥에서 헤어진 친지와 가족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나도 바라본다. 이 순간, 모든 사람은 같은 기분으로 공명하게 된다. 이때 모두는 같은 시간 속에 정지하게 된다. 이에 반해 두 사각형은 일상생활을 상징하듯 규칙적이다. 두 사각형은 우리가 달 속에 영원히 머물 수만은 없다고 일깨워주는 것만 같다. 이에 관한 오광수(吳光洙, 1938-)의 평가 역시 비슷하다.
원은 약간 이지러진 모양을 하고 있는, 그저 자유롭게 그어진 형이다. 실은 그러면서도, 메카닉한, 완벽한 원에서 엿볼 수 없는 밀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기계적인 원에서보다 역설적이게도 둥근 맛을 준다. 아마도 그것은 훨씬 심정적으로 호소하는 반향의 결과일 것이다. 완벽한 원에서는 오히려 차갑고 그런 만큼 축소되어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이상욱이 그려놓고 있는 완만한 선에 의한 원형은 더욱 푸근하고 큰 여운을 남긴다. 어쩌면 이 같은 포만감, 빈 듯하면서도 꽉 차는 느낌은 한가위 보름달을 바라보고 느끼는 한국인들의 보편적인 심리일지도 모른다.
또 하나의 괄목할 만한 것이 바로 서체적 추상(calligraphic abstract)연작이다. 이 연작은 주로 <무제(Untitled)> 혹은 <독백(Monologue)>, <작품(Work)>, <상황(Situation)>이라는 제목으로 지시되며, 1970년대 중엽부터 시작되어 1986년 <작품 86(work 86)>에서 최상의 완결미를 획득한다. 일정한 사선으로 힘 있게 나아가는 필선은 조금씩 다른 벡터를 가지고 나아가다 중첩되거나 덧칠되면서 육중한 구성을 더해간다. 어떤 필선과 그것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색면은 캔버스 일정 부분만을 차지하여 여백의 비어있는 무한으로 한없이 질주하는 듯하다. 어떤 작품은 필선이 중첩을 이루어 여백 없이 전면을 가득 채우기도 한다. 이상욱의 서체적 추상 연작은 사람을 연상시킨다. 앞서 말했듯 필드에서 전쟁을 벌이듯 필사의 노고를 벌이는 ‘비르투스(virtus)’를 연상시킨다. 서체가 마치 캔버스 위에 고요히 우리를 응시하듯 서있기도 하고, 좌면과 우면을 가로질러 질주하기도 한다. 놀랍게도 소동파(蘇東坡, 1037-1101)는 “해서[眞書]가 행서를 낳고 행서가 초서를 낳는다. 해서는 서 있듯이 쓰고, 행서는 가는 것처럼[行] 쓰고, 초서는 달리듯[走] 쓰는 것이다. 서있거나 가는 법 모르고서 질주하는 법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동파는 또한 각 서체가 가지는 아름다움은 각 서체가 지니는 약점을 극복하는 데 자리한다고 가르친다.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바는 반드시 그 어려움을 귀하게 여긴다. 해서는 바람에 휘날리는 것이 어렵고, 초서는 엄중하기가 어렵다. 큰 글자는 빽빽이 결집하여 글자 사이에 틈이 없기가 어렵고, 작은 글자는 관대하고 너그러워서 여유 있기가 어렵다.
이상욱의 서체적 추상은, 첫째로 중첩하여 겹(층위)을 이루어 무거운 구조를 얻는 형식이 있다. 이때 주로 단색 모노크롬으로 무거운 형식을 달래준다. 둘째, 색채를 일필휘지의 빠른 붓질로 화면을 질주하는 형식이 있다. 이때 너무 빠른 필치로 가볍게 들뜨거나 표양(飄揚)되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드럽고 세련된 채색을 동반한다. 셋째, 색면구성주의의 추상과 서체 추상의 절충주의 형식이 있다. 색면구성주의는 이성적 계산이나 논리적 추론으로 완성되는 반면에, 서체 추상은 마음의 격정과 무의식적 표현이 수반되는 바, 이 둘의 모순이 잃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극도의 심리적 평형상태를 유지한다.
나는 지리적 요건으로 사람의 심성이나 문화적 특성을 나누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유럽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남프랑스 사람들이 지니는 지중해적인 밝은 기질과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사람들이 갖는 라인강 유역의 도전적 기질은 각각 유사한 점이 있다. 전자는 몽환적이고 목가적이며 종교적이며 어머니를 연상시킨다. 후자는 현실적이고 수렵적이며 정치적이고 아버지를 연상시킨다. 그런데 중국도 북방과 남방이 다르다. 이는 민국 초기의 천재 학자 왕국유(王國維, 1877-1927)의 말이다. 왕국유에 의하면, 중국 문화는 춘추시대 이전부터 도덕과 정치의 성격이 둘로 양분되었다. 하나는 제왕파(帝王派)이며, 나머지 하나는 비제왕파(非帝王派)이다. 전자에 요․순․우․탕․문․무․주공이 있으며, 후자로 은군자가 있다. 장주(莊周, B.C.369-B.C.286)가 말한 광성자(廣成子)가 이에 속한다. 광성자는 전설에 나오는 옛날의 선인(仙人)으로 공동산(崆峒山)의 석실(石室)에서 진리와 도를 닦으면서 살았다고 한다. 나이가 천이백 살이 되었는데도 늙지 않았다고 하며, 황제(黃帝)가 그의 소문을 듣고 두 번이나 찾아와 지도(至道)와 치신(治身)의 요점을 물었다고 한다. 제왕파의 학문은 근고학파(近古學派)이며, 후자인 비제왕파의 학문은 원고학파(遠古學派)이다. 전자는 귀족파이며, 후자는 평민파이다. 전자는 열성파이며, 후자는 냉성파이다. 전자는 국가파이며, 후자는 개인파이다. 전자의 대표적 학자로서 공자, 묵자가 있으며, 후자의 대표적 학파로 노자와 장자가 있다. 그런데 노자는 초나라 사람이다. 따라서 전자는 북방파이며, 후자는 남방파이다. 이 둘의 유파는 상반되어 조화를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 공자와 접여(接輿)․장저(長沮)․걸닉(傑溺)․하소장인(荷篠丈人)이 조화되기 어려운 것과 같다. 남방학파, 즉 초나라 사람들의 후예들은 격식을 깨부수는 책을 많이 남겼다. 『노자(老子)』와 『장자(莊子)』가 여기에 속한다. 북방의 학문은 예악을 중시했고 도덕적이다. 『시경(詩經)』 삼백 편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중국 북방의 학자들은 “쓰이면 행하고, 버려지면 감춰지는 도(道)를 알고 있는 이는 오직 나와 너(안연)뿐이다.”라고 말하거나,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아가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물러가 숨으라.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 가난하고 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 부유하고 귀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북방의 『시경』의 세계이며, 남방은 『초사(楚辭)』의 세계이다. 전자는 고전적이며, 후자는 낭만적이다. 나는 이러한 왕국유의 구분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분법에 우리나라의 이북과 이남 사람들을 대입해보고 좋아했던 적이 있다. 이북 사람은 『시경』의 엄밀한 도덕을 숭상했고 원칙적이며 도리를 추구했다. 이남 특히 남쪽 사람들은 몽환적인 『초사』의 세계로써 낭만적 대지를 찬미하여 노래로 부르고 시로 읊었다. 판소리가 구성졌으며 도덕의 원인을 강조하기보다 결과를 예술적으로 체념했다. 이상욱 작가의 예술세계는 확실히 『시경』의 세계에 속한다. 북방의 강인한 아버지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이상욱 작가의 세계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생각에 사특함이 없어서 사상이 순수하여 일말의 나쁜 뜻도 없다(思無邪).” 나아가 『시경』 「노송(魯頌․경(駉))」의 4장에 “다른 삿된 생각이 하나도 없으니, 말은 그저 힘차게 앞으로 치달리네(思無邪, 思馬斯徂)."라는 부분이 등장한다. 나는 이 부분이야말로 이상욱 작가의 인격과 예술을 제대로 표명해 준다고 생각한다. 이상욱 작가는 씩씩하고 날쌘 준마를 타고 거친 황야를 달려서 그곳을 준마의 말굽으로써 목초지와 필드로 바꾸었다. 작가의 믿음은 그토록 어렵게 경작된 것이다. (Fidem Colebat)
전시제목이상욱: 더 센테너리
전시기간2023.06.28(수) - 2023.07.29(토)
참여작가 이상욱
관람시간10:00am - 06:00pm
휴관일매주 월요일
장르회화
관람료무료
장소갤러리 학고재 Gallery Hakgojae (서울 종로구 삼청로 50 (소격동, 학고재) 학고재 본관 및 학고재 오룸)
연락처02-720-1524
Artists in This Show
1923년 출생
갤러리 학고재(Gallery Hakgojae) Shows on Mu:um
Current Sh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