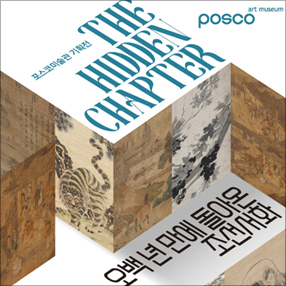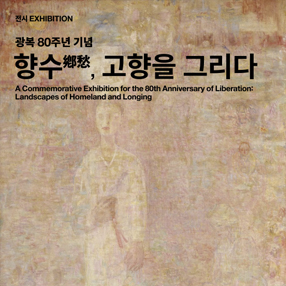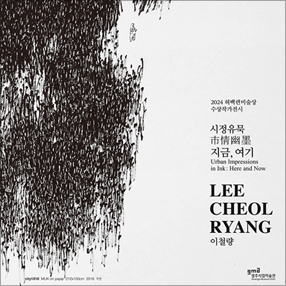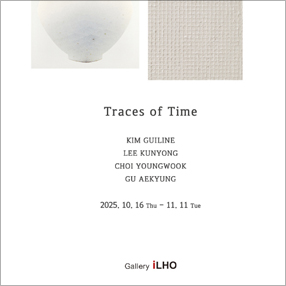본문
-

전시포스터
-
권구희
서재숲3_library forest 3, water color on paper, 232×178cm, 2022
권구희
너에게 안부를 묻다_say good-morning to you, water color on paper, 45.5×53cm, 2021
권구희
솜사탕 나무 cotton candy tree, water color on paper, 45.5×53cm, 202
권구희
서재숲2 library forest 2, acrylic, water color on paper, 232×178cm, 2022
Press Release
그렇게 한 편의 드라마가 된다.
김혜린 / 갤러리 도스 큐레이터
사람이 삶을 기다리도록 만드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다린다는 것, 그것도 삶을 기다린다는 촘촘하게 성실한 행위를 가능토록 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일지를 기대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때때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누군가 다음 주에 방영될 드라마 한 편을 보기 위해서 살아갈 힘이 생기고, 또 다른 누군가 무언가라도 쓰는 동안은 삶을 지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던 것처럼 말이다. 기다림이 없는 삶이란 없다. 그렇기에 삶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삶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삶의 축소판을 지향하게 만드는 것 또한 드라마 같은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결국 사람은 제게로 삶의 면면들이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삶의 모습과 양상들을 창작해 나감으로써 생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낱장으로 모인 종이들로 혹은 모니터 화면으로 보이는 극본에는 삶이 텍스트를 통해 놓여 있다. 문학의 한 장르로서 마련된 극본이라는 하나의 공간은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인상의 각인을 위해 그럴싸하게 놀랍거나 보편적인 삶의 모습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아직 삶은 평면의 화면 안에만 놓여 있게 된다. 이에 연출이라는 관점 즉 새로운 시각과 그에 따라 파생되는 효과들이 삶을 평면적 공간으로부터 새로운 차원의 공간으로 견인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는 그 안에서 주어진 삶의 역할에 임하는 배우와 관계됨으로써 삶의 요소들 하나하나에 입체감과 생명력이 부여된다.
이러한 연쇄작용들은 우선적으로 현실세계에 충실히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작가의 삶이 구축한 내면세계 즉 재구성되고 재편집된 삶의 공간으로부터 소생된 산물로서, 현실과 판타지가 공존하는 현실적 상상으로 관람자와 대면한다. 그리고 바로 이 놀라운 평범함의 지점부터 권구희가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와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학작품 안의 느낌들이 작가에게 영감을 주듯 권구희가 추구하는 작업의 근간은 역시 삶에 있다. 이에 작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과 그러한 인간을 반영하고 투영하는 삶을 공간화하기로 한다. 삶의 공간화 과정은 드라마 제작기와도 닮아서 작가는 작품의 창작 과정 내내 일인 다역을 해낸다.
화면을 구성하는 식물과 같은 자연물들은 현실의 테두리 밖에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다. 현실을 통해 존재하는 것들과 현실로 대변되는 것들이므로 이는 보편적 정서에 가깝다. 따라서 권구희는 보편적 정서와 현실적 상상력을 문자의 획 대신 구상의 선과 면에 대입시키면서 삶의 순간들을 읽어나갔을 적의 인상을 시각화한다. 작가가 써 내려가듯 그려나가는 삶의 순간들은 켜켜이 쌓여 있을 시간과 공간 모두를 포용하며 캔버스 위에 단단하고 밀도 높은 겹으로 구현된다. 나아가 캔버스라는 화면 즉 일정한 평면의 공간 내부에 놓인 다층적인 시공간에는 창과 캔버스로 평면의 화면을 분할하는 연출이 가미된다. 이에 시공간에 새로운 시각이 더해짐으로써 상상력은 자유에 힘입어 무한으로의 확장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작품 속 작가의 시선이 집필자적인 것에서 연출자적인 것으로 배양되는 흐름은 화면을 삶의 현장이 포착된 어느 장면으로 만들며 화면을 구성하는 각 자연물들이 최정예 배우들처럼 저마다의 역할을 갖고 각자가 주인공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휘한다.
이처럼 캔버스라는 평면의 화면으로부터는 새로운 시공간의 세계가 탄생한다. 삶의 여러 단면들을 표방하는 삶의 장면들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각 장면들에는 배우처럼 제 몫으로 제 역할을 소화하는 구상 요소들이 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어느 것 하나에도 허투루 작가의 의식과 손이 닿는 법이 없다. 덕분에 모두가 바쁘게 제 몫을 이행하는 주인공으로 기능한다. 구성요소들에 입혀진 짙은 빛깔의 색채에서는 피로감이나 극적 충동이 아닌 친숙함과 자연스러움이 강조되는데 이는 채색의 성숙을 의미한다. 여러 번과 여러 겹으로 칠해지는 과정은 시공간의 축적과 맥을 함께하기 때문이다.
권구희가 일구어낸 현실적 상상은 어느 순간 우리가 한 번쯤 어딘가에서 마주한 것만 같은 그 끝없이 연속적인 공간으로 몰입시킨다. 내가 혹은 당신이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느끼고 꿈꾼 적이 있기에 그리움으로도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상은 삶에 대한 열의를 회자한다. 나에게 마주 닿고 나를 둘러싼 삶의 기척과 감촉들을 생생하게 인식함으로써 기쁨을, 기쁨보다 더한 희열을, 희열과는 반대되는 슬픔을, 슬픔보다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체험한다. 그렇게 당신은 당신이 한 편의 드라마를 감상하며 충만하게 만끽하고자 했던 삶의 양감과 질감들이 전이되는 판타지를 경험한다.
캔버스와 캔버스, 캔버스와 창, 그리고 공간을 반영하는 공간은 삶의 장면을 포착하는 액자와도 같고 액자식 구성은 삶을 새롭게 하고 내부와 외부를 면밀하게 관전하도록 만든다. 이 문학적 장치는 삶아가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자 애정의 징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액자마다 포착된 인간은 옴니버스 드라마로 기록된다. 우리는 이 드라마가 건네는 현실적 공감을 통해 성숙되며 때때로 현실적인 듯 시공간을 초월하는 판타지적 감수성을 통해 자유를 희망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작가를 통해 한 편의 드라마가 되는 각자의 서사와 서정을 갖고 있는 나와 당신인 동시에 서로가 공명한다. 나와 당신의 드라마를 관전함으로써 그대로 살아가 볼 만한 삶이라는 위로를 얻으며 삶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서재 숲 Library Forest
맘에 드는 책을 서재에 진열하듯,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시선이 머무는 순간의 부분들을 마음의 공간에 진열해본다. 벽이나 서재 안에 기대어 있는 캔버스는 마치 어느 화가의 휴일에 남겨진 공간과 같이 나른하고 따스하게 느껴진다. 자리를 비운 화가의 공간에 들어가 감상하며 사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처럼 나와 타인, 공간과 캔버스가 좀더 친밀해질것만 같다.
매일 아침 창 밖의 목련나무가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아침에 일어나면 블라인드를 걷고 나무부터 보게 된다. 빛을 받아 무채색의 가지가 황금빛을 띄고 어제 동그랗던 새순 봉오리가 열리기 시작한다. 나무만 빛을 받고 뒤의 건물들은 회색빛이 되어, 마치 핀조명을 받은 나무가 주인공인 연극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아름다운 연극을 매일 혼자 보는것이 아까울만큼 짧고 찬란한 순간이다. 그 황금빛 아침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마음에 소유한다. 키우는 식물들도 봐 주어야 한다. 어느 부분의 잎파리들이 갈색이 되진 않았는지. 물이 모자라 쭈글해 지진 않았는지. 바람이 필요하진 않은지. 매일 산책을 하면서 집 앞 공원을 걸을때 보게 되는 나무들도 한 순간이 어제 같지 않다.
찾아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아침마다 보게되는 보물같은 순간들이 있다. 각기 다른 색감과 명도, 채도를 지닌 얇고 반투명한 잎사귀들이 후광을 받아 반짝인다. 어린시절 소풍에서 숲 안 보물찾기 시간에 한번도 보물을 찾아본 기억이 없다. 선생님들이 일부러 숨겨놓은 보물이 적혀있는 쪽지는 못찾았지만, 우연히 오래전 책속에 넣어둔 나뭇잎을 발견한 것처럼 문득 마음에 남은 어릴적 순간들은 떠오른다. 모래밭에 달려가 햇빛에 부서지는 빛나는 모래알을 한참을 바라봤던 순간. 강가에서 발견한 겹겹이 여러 회색빛이 감도는 납작한 돌에 매료되어 이리저리 돌려 보았던 순간. 등교길에 마치 인사를 하듯 흐드러지게 흔들리는 나뭇잎들의 생명력을 느낀 순간. 호수에 비친 다이아같은 빛들을 망연히 바라보니 배를 탄듯 느껴졌던 순간. 자연이 숨겨놓은 보물들을 찾았던 기억들. 지나고 기억하니 소풍에서의 상실감을 보상받은 듯한 순간들.
시선은 곧 애정이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의 안부를 묻는 것과 같다. 자연을 관찰하고 누군가의 표정을 살피는 것은 그의 안부를 묻는 것이다. 그가 정말 괜찮은건지. 시선은 곧 소유다. 무언가나 누군가를 좋아하면 소유하고 싶어지는데, 그것은 그 사물이나 사람을 물리적으로 가까이 두고 자주 보고 싶다는 의미이다. 누가 무엇을, 누가 누구를 진정으로 소유할 수나 있는 걸까. 때로는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무색할만큼 무언가를 마음에 두면 잡히지 않고 달아나기도 하고, 손 안에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면 그 무엇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옅어지기도 한다. 누구도 무엇을 영원히 소유 할수는 없을 것 같지만, 매일 넘치는 소유욕에 무엇을 구매하고 구애하며 사는 것만 같다.
익숙한 공간을 매일 지나면 새로움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어제 본 나무는 어제의 나무가 아니다. 새로움은 익숙함을 견딜수 있게 해준다. 새로운 시선이 익숙한 공간에 닿는다는 것은, 마치 마음에 남은 문학의 어느 한 구절이 지금 내가 몸 담고 있는 삶에 낮은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깔아 가치있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과도 같다. 내가 보는 삶과 타인이 보는 삶의 시선들이 섞인다는 것. 지루해진 일상이 새롭게 보인다는 것만큼 근사한 것이 있을까.
하루마다 다른 모양과 빛의 나무들 안에서, 매일 주황빛의 색감이 미묘하게 다른 노을들 안에서, 그 순간만 주어진 보물들을 발견하곤 한다. 자연과 그림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그것을 마치 잠시 잠깐 소유한 것만 같은 착각과 함께 풍족함을 느끼게 해준다. 내가 찾은 순간의 보물찾기 쪽지들에는 어떤 글자가 쓰여져 있던걸까. 보물들에 잠시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매일 이고 지는 삶의 무게는 가볍고 가벼워져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손안에 들어오는 한뼘의 캔버스가 자리잡는다.
2022. 4월
■ 권구희전시제목권구희: 서재숲
전시기간2022.05.11(수) - 2022.05.17(화)
참여작가 권구희
관람시간11:00am - 06:00pm
휴관일없음
장르회화
관람료무료
장소갤러리 도스 Gallery DOS (서울 종로구 삼청로7길 37 (팔판동, 갤러리 도스) )
연락처02-737-4678
Artists in This Show
1986년 서울출생
갤러리 도스(Gallery DOS) Shows on Mu:um
Current Sh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