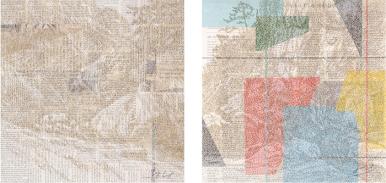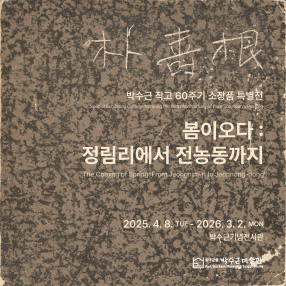본문
-
이길우
동문서답Irrelevant Answer 190X270cm. 2007, Dancer in Nature 01005. 164X130cm. 2010
이길우
2016년 개인전 ‘오고 가는 길, 스쳐지난 길’ 시리즈, 80X80cm, 2016 순지에 향불, 장지에 채색한지, 신문한지에 프린트, 꼴라쥬, 배접, 코팅
이길우
날고싶은, 새, 127X184cm, 2020 순지에 향불, 장지에 채색 및 혼합기법, 배접, 코팅
이길우
모자상, 248X191cm, 2021
이길우
끈적한, 갈증해소, 123.5X184cm, 2021 순지에 향불, 장지에 채색 및 혼합기법, 배접, 코팅
Press Release
선화랑 (원혜경 대표)에서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국화가 이길우 작가의 '108개 와 Stone' 展이 열린다.
향불작가라 불리우는 한국화가 이길우의 작품은 향불로 한지를 태워 생긴 수많은 구멍으로 형성된 하나의 이미지와 또 다른 이미지를 중첩, 배접하고 코팅하여 완성하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화면을 선사한다. 사실적인 묘사에 치중하기보다는 그만의 독특한 재료인 향불로 드러나는 구멍을 통해 두 중첩 이미지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는 2003년 늦가을 어느 날, 우연히 올려다 본 은행나무의 마른 잎 무더기가 역광에 비쳐 까맣게 그을려 보인 것에 착안하여 지금의 작업방식의 모티브와 영감을 얻었다. 가족이나 주변 인물들을 등장시킨 초기 작업을 거쳐, 대비되는 동서양의 정서를 한 화면에 넣은 동문서답 시리즈 등을 선보인 바 있고 최근은 신문과 염색한 한지 콜라주 등 다양한 화면구성을 시도, 새로운 창작 방법을 지속해서 탐구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선화랑개인전에서는 일상에서 오고 가는 길에 무수히 스치고 만난 주변 풍경이 어느덧 향불 작업과 어우러져 '오고 간 길, 스쳐 지난 풍경' 시리즈로 탄생했다. 뇌리에 스치는 풍경들을 옮겨내어 집과 작업실, 부모님이 계신 요양원, 학교 등, ‘오고 가는 길’ 혹은 ‘스쳐 지난 풍경’ 이 고스란히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 작품에서 주로 보이는 풍경에 스미듯 등장한 신문의 글귀는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소통의 역할을 대변한 것이기도 했다. 늘 가까이 있는 소소한 풍경들로부터 시간과 추억, 삶의 여정을 되돌아 보며 우리의 일상을 담아낸 파노라마 다큐멘터리로 다시 태어난 작업이었다.
과거 작품들 속에서 동양과 서양, 고전과 근대, 그리고 현대의 인물과 풍경들이 결합하고 융합되면서 제3의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면 이번 전시에서 그는 다시 가족과 자기 자신, 소소한 일상의 대상으로 시선을 회귀시켰다. 그것은 일종의 성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작가는 자신의 모습을 타인을 통해 바라보고 타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 본질적 사유는 결국 ‘욕망’이라는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비롯된다. 위의 작품명 <날고 싶은, 새>를 들여다보면 ‘날고 싶다’는 것은 날기 힘들거나 날 수 없다는 의미지만 ‘새’는 날 수 있는 존재이다. 옛 사진으로부터 차용한 작품이미지들 또한 촌스러워 보이고 지금보다 힘겨웠던 시기였을 테지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막상 돌아가자면 엄두가 안나는 지금의 현실이 떠오르는 감정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삶 속에는 결핍과 희망,바람의 두 욕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이번 전시 타이틀 ‘108개 와 Stone’ 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 숫자 108은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부여한 의식적이고 통념적인 의미가 되었지만 작가는 그것은 단지 허상과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관념을 이야기하려 한다. Stone은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일 수도 건축물의 중요한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무의미했던 존재가치가 예술활동의 의식 속에서 새로운 개념과 창조적 관점을 내포하는 것임을 말한다. 작가이자 창작자로서 통상적인것에서 벗어나 일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인지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자 한 작가의 의지를 함께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양작적인 태도와 생각이 존재하고 공존하는 것임을 작품을 통해 시각적으로, 작업행위로도 보여주고 있다.
순지에 향불, 장지에 채색 및 혼합기법, 배접, 코팅 그림을 멀리서 보면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있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무수히 태워진 흔적의 구멍이며, 뚫려 있어 비어 있는 실체이다. 향불에 타서 소멸된 공간들이 다시 모여 형상을 이룬 전면의 이미지와 후면의 또 하나의 다른 이미지를 함께 배접하여, 향불이 그려낸 형태와 바탕의 그림이 중첩되면서 2중의 이미지가 동시에 떠오르게 된다. 두세 개의 그림이 중첩되면서 공(空)은 형태를 만들어 내고 중첩된 색(色)과 형태는 바탕이 되어 다시 공(空)이 된다. 색즉시공 공즉시생(色卽是空 空即是生)의 철학을 작업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불교의 윤회사상(輪回思想)이 작업에 배어있다.
작가 이길우는 이번 작품에서 좀 더 사실적인 표현에서 상징적 표현으로의 전향을 시도하며 그 속에 삶의 양면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품<끈적한, 갈증해소>는 특히 그러한 양면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순간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지만 결국 더한 갈증을 유발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시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인간의 나약함과 그것을 이용한 기업의 부도덕한 상업적 태도를 탄산음료로 대변하였다.
작품<관객>은 화려한 무대와 품위있어 보이는 사람들 뒤에 감춰진 그늘과 외로움, 인간의 본질을 예리하게 파헤친 것이기도 하다. 근작의 화면에는 7, 80년대 브라운관 TV에서 화면을 가르는 전파 신호선을 이미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TV화면에 나오는 영상과 이미지들은 사실 수많은 화소로 이루어진 환영이나 우리의 시각으로는 바로 인지되는 것처럼 이길우의 작품 또한 주관과 대상이 분리된 듯 보이지만, 하나의 동일한 실체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지라는 고전적인 재료에 구멍을 뚫어 현대인들이 쉽게 접하는 TV 모니터의 망점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양면적인 삶의 단면적 모습, 인간과 자연과 문화를 가상과 실제라는 관점에서 생명의 모든 것을 연결시키고자 한 것이다. 실체이지만 동시에 가상의 것과 같은 것이며, 가상현실과 실제, 그사이의 시공간을 초월한 소통의 문제를 온라인이 아닌, 자신의 작품평면에서 아주 담백하게 다루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각 분야와 계층은 갈등과 고충, 격차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 가장 큰 변화는 외부환경과의 접촉과 활동의 제한이었다. 그로 인해 우리를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의 세계, 온라인과 같은 비대면 환경에 더욱 노출, 친밀하게 만들었다. 미래로 다가갈수록 현실 속에서의 인간 대 인간의 직접적인 만남과 소통은 축소되어 가고 있다. 온라인 속의 가상세계는 광범위한 분야로의 접근의 용이함, 밀접함,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인간의 삶 속에서 또 다른 결핍과 욕망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현실에서의 인간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그것을 통찰하며 성찰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길우의 작품을 통해 현시대의 우리 인간의 실체와 존재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선화랑
이길우 개인전 – ‘108과 Stone’
1. 생성과 소멸, 윤회사상으로부터 메타버스까지.
이길우 작가의 작업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화선지에 밑그림을 생성(生成)한다. 그리고 향을 사르고(작가는 향이 불로 화하고 재로 사하는 것 또한 생성과 소멸의 과정으로 본다), 향불은 화선지에 그려진 하도(下圖)의 형태를 태우면서 기존의 밑그림을 소멸(燒滅)한다. 향불에 타서 사라진 공(空)의 공간들은 다시 모여 하도(下圖)의 형태를 이루면서 서서이 재생성(再生性) 된다. 또한, 미리 그려 놓은 다른 그림과 배접하여 향불이 그려낸 형태와 바탕의 그림이 중첩되어 2중의 이미지가 동시에 떠오르게 한다. 두세 개의 그림이 중첩되면서 공(空)은 형태를 만들어 내고 중첩된 색(色)과 형태는 바탕이 되어 다시 공(空)이 된다. 색즉시공 공즉시생(色卽是空 空即是生)의 철학을 작업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불교의 윤회사상(輪回思想)이 작업에 배어있다. 주역의 ‘계사전’에서 우주의 본체가 도(道)라고 한다면 우주에서 음과 양이 싸우고 상호작용하면서 끝없이 순환해 가는 것을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로 설명하는데, 이 의미와도 상통한다. 제목의 108이라는 숫자도 해석에 따라 불교적 의미도 있지만, 어쩌면 의미 없는 일반적인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 절대성을 부정하면서 유연한 삶의 길을 제시하고 해석하는 도가사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
요즘 메타버스(유니버스(Universe)와 ‘가상,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의 합성어) 라는 주제가 참 뜨겁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이길우의 작업은 가상현실과 시공간을 초월한 소통의 문제를 온라인이 아닌, 평면에서 아주 담백하게 다룬다. 7, 80년대 브라운관 TV에서 화면을 가르는 전파 신호선이 화면에 등장한다.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보지 못했을 법한 풍경이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서 살짝 간접경험을 해보았을까? 작가는 어릴 적 감성을 지금 현대사회상에 투사하고 있다. 작가는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감성을 합성해서 시공간을 넘어, 기억의 벽을 허물면서 소통의 새 길을 열어놓는다. 이런 작업의 형태는 이전부터 작품에 녹아있었다. ‘동문서답’이라는 작품들 속에서 동양과 서양, 고전과 근대, 그리고 현대의 인물과 풍경들이 결합하고 융합(fusion or crossover) 되면서 제3의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이전의 명료한 형태와 색이 사라지고 꼭 있어야 할 형태와 무심히 던져진 색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조형 언어가 화면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시각에서 소소한 일상의 풍경과 내면의 소리에 집중했다는 것이, 이번 작품들에서 변화된 특징이다. 우리는 이번 이길우의 작품을 보면서 서사적이고 명료한 표현보다는 조형의 본질성과 상징적인 느낌들로 구축된 작품의 깊이감에 더욱 빠져들게 된다. 특히 뉴욕여행의 잔상들로 이뤄진 작품들은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다. 그 작품들을 관통하는 사고에는 끝없는 ‘욕망’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숨어있다.
2. 인간의 욕망과 모순이 삶이 되다.
어느 가을날, 작가가 지친 몸을 쉬며 바라본 하늘에서 수많은 나뭇잎 사이사이로 빛이 쏟아져 내렸다. 그 빛줄기들은 그렇게 이길우 작가의 모티브와 영감을 주었다. 작가는 ‘생성과 소멸’의 반복인 윤회사상을 담은 철학적 접근을 통해서 동양과 서양, 고전과 현대, 기쁨과 슬픔, 환희와 좌절, 흥함과 쇠함, 강함과 약함을 대비시키면서 삶의 본질을 이야기해 왔다. 초기에는 가족의 이야기로부터, 그리고 사회와 세계로 시야를 넓혀갔다. ‘동서양의 역사와 삶, 그리고 예술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화면에 향불로 피워냈다. 그러나, 이번 전시에서 그는 다시 가족과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회귀(回歸)시켰다. 그것은 일종의 성찰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자신의 모습을 타인을 통해 바라보고 타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자신을 발견한다. 이 본질적 사유는 결국 ‘욕망’이라는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비롯된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는 욕망에 대한 위협을 이성으로 통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후, 헤겔을 비롯한 이성주의가 한참 인기를 구가하던 때, 쇼펜하우어(Schopenhauer, Arthur 1788~1860)는 “인간은 의지가 구체화 된 욕망덩어리이고, 끝없이 새로운 욕망을 갈구하며, 그 본성이 고통이기에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금욕생활과 윤리적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근대 과학적 유물론 철학에 격렬히 반대했던 철학자들 중, ‘질 들뢰즈’와 ‘자끄 라캉’이 있다. 인간이 60조 개가 넘는 분자로 구성된 기계로 치부한 유물론적 시각에 대해서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는 인간을 ‘욕망하는 기계’로 정의하면서 ‘욕망은 생산을 낳고 억압으로부터 욕망이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전의 철학이 이성과 합리성에 국한했던 것에서 ‘욕망의 생산적 힘’을 수용하려 한 것이다. 이에, 라캉(Jacques Lacan 1901~ 1981)은 들뢰즈의 이론에서, 욕망이 생산적인 방향으로만 향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저지하는 상반되는 현상이 있음을 지적했고, 욕망에 대해 타인에게 비친 자신이 타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끝없이 애쓰는 것이라고 보았다. 현재의 나의 모습에 만족했을지라도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타인의 요구에 맞춰줌으로써 적합한 주체자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욕망은 멈추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은 쇼펜하우어의 욕망에 관한 주장과도 비슷하다.
이번 전시에서 위의 내용을 수용한 대표 작품으로 ‘날고 싶은 새’라는 작품이 있다. 날고 싶다는 말은 날기 힘들거나 날 수 없다는 말이다. 한 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야기와 사건, 그리고 인물들은 여전히 주목받고 싶어 하고 세상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은 냉담하다. 더는 그때, 그 일과 인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렇게 잡지책에 소개됐던 사건들은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 간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누구나 잘났건 못났건, 싱싱했던 젊음이 있었고 한 번쯤 주목받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각자 인생의 페러다임이 있는 것이다. 촌스럽기 그지없던 옛날 사진 속 자신의 모습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던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 것이다. 그러나, 그 젊음이 너무 힘들었다면, 다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 현실도 함께 존재한다. 어느 쪽이든 결핍은 욕망을 만들어 내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완전한 만족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욕망의 속성이다. 욕망, 그것은 결국, 현실의 결핍이 만들어 낸 것임을 작가는 말하고 있다.
3. 일상에서 발견하는 필연과 우연, 그리고 양면성에 관하여
작가 이길우는 이전의 작품에서 보여주던 사실적 표현에서 상징적 표현으로의 전향을 시도했다. 우선 형태는 굳이 완벽한 묘사를 하지 않는다. 다른 작가들이 갖기 힘든 기량 중에 사실적 표현력이 뛰어난 작가가 자신의 가장 강력했던 무기를 포기한 것이다. 그는 그것을 버리고 무엇을 획득하려 한 것일까? 또한, 이번 작품들에서, 채색했다기보다는 색을 화면에 툭, 툭 던진 느낌이다. 그리고, 배경에 보이던 이중의 다른 형태들을 포기하고 자기만의 조형성을 과감하게 표현했는데, 이 방법 역시, 그렸다기보다는 던진 느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동양화에서 사군자를 그린다고 표현하지 않고, 사군자를 친다고 표현한다. 그렇듯 자신이 지금껏 구축해 온 표현방식을 벗어던지고 과감하게 칼을 휘두르듯이 치고 던지면서 기(氣)를 불어 넣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사혁이 정립한 화론육법 중에 기운생동(氣運生動)을 적극적으로 실현한 것이라고 할까. 그렇게 함축되어 던져진 형태와 색이 결합하면서 묘한 조화와 깊이 있는 조형성이 탄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작가가 의도했던 ‘우연과 필연’이다.
중국의 남북조시대 남제의 화가이며, 최고의 비평가로 알려진 사혁(謝赫)은 그의 소책자 「고화품록(古畵品錄)」에서 화론육법을 그림의 가치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인물(특히 초상화)을 표현할 때, 사람의 표정과 터럭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표현하면서 대상 인물의 정신까지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대 이전까지의 동양회화는 육법 중 사실적 묘사를 이루기 위해서 응물상형(應物象形), 수류부채(隨類賦彩), 전이모사(轉利模寫)를 따라야 함이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작가들은 새로운 시도와 사상을 접하면서 새로움에 도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길우는 ‘과연 진정 작가가 표현해야 하는 근본적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관객’ 시리즈를 보자. 공연을 관람할 때는 모두 한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쉬는 시간 로비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은 어떠한가? 모두 방향을 잃은 사람들처럼 제작기 다른 표정과 몸짓을 한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또한, 제각기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사회가 정의하고 길들인 대로 교양있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그 내면의 고독과 허무, 외로움은 평생 달고 살아야 하기에, 그들의 표정과 행위를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담아내는 것은 정신과 내면까지 담아내는데 오히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가는 화려한 무대와 품위 있어 보이는 사람들 뒤에 감춰진 그들의 그늘과 인간의 본질을 작가는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다. ‘끈적한 갈증 해소’라는 작품은 그러한 양면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잠시 목마름을 해소해주지만 더한 갈증을 불러오는 것이 탄산음료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혈액을 끈적이게 만든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갈증이 나면 다시 찾는 반복적 우매함에 빠지게 된다. 작가는 그렇게 나약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것을 이용한 기업의 부도덕한 상업적 태도를 질타한다.
4. 존재의 진리에 은닉한 본질에 대한 통찰
작가는 젊고 이쁘셨던 어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오신 항아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치매에 시달리고 계신 지금의 어머니가 가슴에 맺혀왔다. 작가에게 그 항아리는 그냥 오래된 볼품없는 항아리가 아니다. 작가의 손을 거쳐 향으로 피어오르면서 명품항아리로 되살아난다.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는 ‘예술작품의 근원’이란 글에서 예술작품에서 존재들의 진리와 본질이 어떻게 되살아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예술작품의 본질이란 “작품 안에 존재자의 진리를 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하이데거가 농촌 아낙네의 구두를 그린 반 고흐의 그림을 통해 “도구존재의 진리는 유용성이 아닌 신뢰성이고, 이 진리는 신발 자체를 설명함으로써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반 고흐의 그림을 통해서 발견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메이어 샤피로(Mayer Schapiro, 1904–1996)라는 미술사학자는 그 구두가 고흐의 자화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하이데거와는 다른 견해를 전개하기도 했으나, “예술작품은 사물의 본질을 사물에서 추상해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사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라는 하이데거의 주장에는 서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바로 ‘예술의 본질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데거가 말한 대로 “예술의 창작행위는 존재의 진리를 창조적으로 생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앞의 것과 통상적인 것에서부터 진리를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은닉으로부터 개현하는 존재 자체로부터 길어 낸다.”는 말에 필자 또한 공감한다. 작가 또한 이 부분을 작품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가 화두로 던진 Stone_돌의 의미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아무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 돌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작가의 손을 거쳐 화폭에 되살아난 ‘돌’은 그냥 발에 차이고 굴러다니는 사암(砂巖)이나 현무암(玄武巖) 또는 다른 성질의 사물 자체일 수도 있지만 수천 년, 수만 년 깎이고 견고케 된 풍상과 시간을 머금은 우리의 역사일 수도, 우리의 자신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돌은 그저 길가에 구를 수도 있지만 멋진 건축물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체로 예술품이 될 수도 있다. 작가는 그런 사물과 인물에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참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플라톤이 말한 이 세상이, 그리고 예술이 그저 모방이라고 말하기엔 한계를 갖는 대목이다. 이번 이길우 개인전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밖으로부터 안으로, 아래로부터 위를 향한 통찰과 성찰 그 자체이다. 아름다움의 본질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이라고 봤을 때, 다음 그가 보여 줄 미(美)와 선(善), 그리고 본질에 대해 어떻게 질문을 던질지 더욱 궁금해진다. 향불이 만들어 놓은 점 하나하나의 공(空)이 더욱 크게 부유(浮游)해 온다.
글. 여주시 미술관 「아트뮤지엄 려」 이홍원 학예실장(동양미학 박사)전시제목이길우: 108개 와 Stone
전시기간2021.11.10(수) - 2021.12.04(토)
참여작가 이길우
관람시간10:00am - 06:00pm
휴관일없음
장르회화
관람료무료
장소선화랑 SUN GALLERY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8 (인사동, 선빌딩) )
연락처02-734-0458
Artists in This Show
선화랑(SUN GALLERY) Shows on Mu:um
Current Sh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