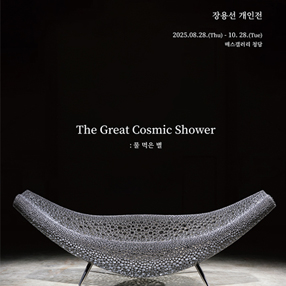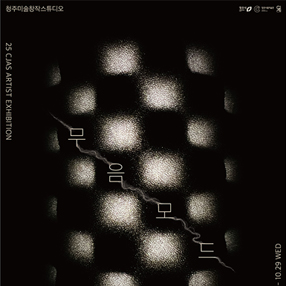본문
-
강선호
동상이몽-서울 Oil on canvas, 162.2×130.3㎝, 2010
강선호
동상이몽-서울역 Oil on canvas, 162.2×130.3㎝, 2010
강선호
동상이몽-후리지아 Oil on canvas, 90.9×72.7㎝, 2010
강선호
동상이몽-장미꽃들 Oil on canvas, 72.7×60.6㎝, 2010
강선호
동상이몽-장미변형 Oil on canvas, 72.7×60.6㎝, 2010
강선호
동상이몽-광화문 Oil on canvas, 72.7×60.6㎝, 2010
강선호
동상이몽-한국은행B Oil on canvas, 72.7×60.6㎝, 2010
강선호
동상이몽-한국은행P Oil on canvas, 72.7×60.6㎝, 2010
Press Release
서울역’과 ‘트윈 픽스’ 사이에서
예술은 순수하게 비인간적으로 존재할 때 정당하다. 예술이 문화, 즉 인간이 살고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또 현실논리가 작동하는 곳에서는 정당하지 않다. 문화로서 예술은 오류와 결핍을 품는다. 그러므로 한 작가의 예술정신, 욕망, 마음은 문화적이며 사회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술의(神)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않다.한편 삶의 중력이 최고점에 이른 저 무저갱의 차원과 중력이 0에 이르는 허무맹랑한 환영의 임계점에서 작가가 본 것은 또 무엇일까? 작가가 본 세계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일까? 목격자로서의 작가는 관찰자가 아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힘껏 그 현상에 몸을 담그고 깊이 개입하는 체험과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고 교류하기 위한 소통을 위한 비평의 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모든 창작자들의 딜레마이다.
강선호의 그림은 왜곡된 건물과 인물과 꽃이 모여 있다. 작가는 마치 잠결에 본, 또는 취한세계를 기록하고 있다. 의식이 모호한 상태의 뒤틀리고 그로테스크한 풍경은 심리적이다. 작가가 처한 어떤 심리 상태, 그 지점에서 풍경은 제 모습을 숨긴 채 다른 모습으로 다른 차원으로 들어선다. 그와 함께 작가도 동반하는 이상한 여행이 되어버린다. 작가의 이미지는 언어적 형식이나 문장이 아니다. 의미 없는 어떤 공허, 불길한 암시이거나 전조(前兆)로 가득하다. 시간과 공간이 뭉그러지고 지금 여기서 느끼는 나의 현실감은 의혹덩어리가 된다. 화면은 붉은 폭풍이 몰아치고 대기는 회오리치는 불안을 조성한다. B급 공상영화의 한 장면처럼, 죽지도 살아있지도 않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서성거리는 이들이 몰려나올 것 같은 서울역의 하늘은 불길하다. 하늘은 사라지고 접힌 주름들은 현실이 아니면 데이비드 린치(David Lynch) 감독의 트윈 픽스(Twin Peaks: Fire Walk With Me, 1992)의 꿈을 재연한다. 하늘은 꽃들로 가득하고 결코 화사하지도 아름답지도 않다. 꽃의 모양을 하고는 있으나 그것은 모래로 만든 모조일 뿐이다. 빈자리 없이 가득 메운 이미지는 과실재이며 과잉이며 그것은 동시에 완전히 결핍된 것이다. 이 생생한 조화(造花)는 숨을 멈춘 채 건조하다.
트윈 픽스의 로라 파머인가? 등 돌린 여인은 언어(의미)를 잃어버린 채 미지의 차원의 세계에 떨어져 자기가 본래 있었던 세계를 찾는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자신이 죽었는지 또는 살아있는지 알 수 없다. 밝음도 어둠도 아닌 회색의 공간, 회색의 감각이 서울역과 여인과 빌딩과 하늘을 뒤엎고 있다. 이 세계는 붉으나 붉지 않고 노랗지만 노랗지 않다. 현실의 모든 색과 형태는 회색으로 환원된다. 초현실주의자들이 현실을 너머선 상태를 통해 지금 현실을 비평하고 반성하는 것처럼, 작가는 뒤엉킨 세계로 넘어가는 운동을 통해 일상과 현실 속의 자신을 되돌아본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리를 갖는 것이 곧 반성과 성찰을 위한 첫 단추이다. 우리는 또는 작가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류이거나 환영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그것이 논리적 인식이건 또는 감각의 논리의 결과이건, 자기 자신의 리얼리티를 찾는 것은 오랜 과제이며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길을 막는 벽일 수 있고 또 우연히 다가온 기회일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희귀하다. 예외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자기 자신의 변형되고 왜곡된 상(IMAGE)와 접촉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불안과 불신을 옆에 달고 있는 것이다. 사회 속의 예술은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오늘날 예술은 선악의 너머에 있거나 또는 취향의 너머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어쩌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예술이란 것은 아주 오래전 멸종해버린 ‘것’일 지도 모른다.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면서 자기 실존성을 지닌 것을 우리가 흔히 ‘타자’라고 부른 ‘것’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째든 우리가 또 작가가 그 안에 깊이 빠진 채 다루고 있는 이 예술이라는 ‘것’은 인식할 수 없는 ‘타자’ 또는 단지 소통불능의 상태를 지칭하는 표식에 지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것은 마치 프로이드가 말한 의식의 검열을 교묘하게 통과하여 아주 잠시 무의식이 남긴 흔적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인간 의식의 역사는 결코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을 만나기 위해 ‘타자’를 발명하고 활용해온 역사이다. 예술 아니 시각이미지의 역사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작가 강선호를 매개로 캔버스에 정착된 이미지는 단지 건물이 아니고 단지 꽃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타자’가 자신을 위장한 채 걸친 베일과 같은 것이다. 회화는 정교하게 계획된 타자의 음모를 기록한 셈이다. 위장한 채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것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드러난 것만이 마침내 드러난다. 이 실존의 형식을 뒤틀고 어긋나게 하는 행위를 창조라고 부를 수 있다.
강선호를 비롯한 모든 이미지메이커는 실존의 문제에 있어 빈번히 반칙을 저지르는 무뢰한이 된다. 돌발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우리를 매료시킨다. 근래 페인팅과 드로잉이 미술계의 중요한 형식으로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회화의 형식을 빌어 현재의 삶과 실재(Reality)를 표현하려는 작가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 많은 화가들이 모두 자기만의 화두와 감각을 갖고 나아간다. 마치 오래전 그리스의 오디세이가 행했던 한편의 모험담이자 거대 서사시처럼. 잘 알려졌다시피 오디세이는 그리스의 영웅들 가운데 최고의 꾀돌이다. 그의 합리적이며 빛나는 계몽적인 정신은 근대정신(Modernity)의 모델이었다. 그러나 이야기 속의 오디세이가 무수히 극복해온 신들과 괴물들과 비합리적 신화의 세계는 결코 극복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닌 채 실존의 조건으로서 베일(Veil)에 쌓인 채 무대의 뒤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것이다.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타자라고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 불리건 그것은 무한의 물음표들과 느낌표들이 교차하며 등장하는 초실재, 초현실로서 있는 것이다. 오디세이는 영웅이지만 동시에 반영웅이 된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모든 예술가들은 오디세이의 후예가 된다.
작가는 연쇄하는 이미지들은 매우 강박적이거나 히스테릭한 심리상태를 넘나들면서 정상과 비정상, 의식과 무의식, 섭리와 우연의 경계를 조율하고 조정한다. 거기에서 우리는 작가 강선호의 현실은 무너지는 곳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눈치 챈다. 붉은 폭풍우에 뿌리 채 뽑혀버린 일상과 현실은 무너지고 해체된다. 작가와 함께 우리 모두는 서울역이 아닌 트윈 픽스 역에 내린 채 어리둥절 하는 로라 파머가 되어버린다. 주위는 나를 겁탈하는 불길한 기운 외에 아무도 아무것도 없다.- 김노암(상상마당 전시감독)전시제목同床異夢 - 동상이몽
전시기간2010.11.10(수) - 2010.11.16(화)
참여작가 강선호
초대일시2010-11-10 17pm
관람시간10:00am~18:00pm 공휴일 오전10시30분~오후6시
휴관일없음
관람료무료
장소JH갤러리 JH gallery (서울 종로구 관훈동 29-23 인사갤러리빌딩3F)
연락처02-730-4854
Artists in This Show
JH갤러리(JH gallery) Shows on Mu:um
Current Sh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