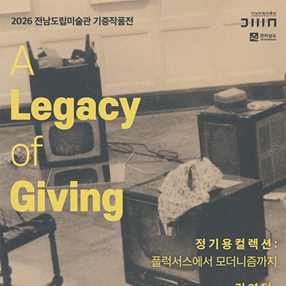본문
-
최성철
광화문 설치 전경,
최성철
광화문 설치 전경,
최성철
설치 전경,
최성철
설치 전경,
최성철
설치 전경,
최성철
설치 전경,
최성철
설치 전경,
Press Release
최성철의 <광화문> 연작이 재현하는 실존의 온기
최선영 | 문화학 박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교차학과
광장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공개된 장소이다. 누구라도 오갈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린 장소.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관념은 멈춰있었다. 팬데믹 시기를 지나는 동안 나에게 광장은 열린 곳이 아니라 닫힌 장소였고, 피해야 할 곳에 지나지 않았다. 자연스레 광장에 얽힌 추억도, 그에 관련된 이야기도 묵음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칠다기보다는 매끄러운 편에 가까운 형상 하나가 다시금 광장에 대한 나의 기억을 상기하게 했다. 광장, 한동안 잊고 지내던, 내 속에서 단절되었던 광장은 나에게도 여러 기억으로 수놓아진 공간이었다. 나도 과거 어느 시간에는 광장을 거닐고 있었고, 또 다른 시간에는 광장을 눈에 담고 있었다. 이런 기억들이 형상화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작가 최성철에게 광화문광장은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눈물’로, ‘권위주의와 거대한 문화회관의 그림자’로, 또‘말없이 지켜보는 이순신 장군’으로 기억된다. 그 장소는 그렇게 얽힌 기억의 시간들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은 새롭게 변화했고, 과거의 모습은 서서히 잊혀가는 듯했다. 그러나 모습은 달라져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작가 최성철은 하나의 공간에 중첩된 시간을 드러내는, 새로운 미학적 경험을 선사하는 <광화문> 연작으로 광장에 새겨진 시간을, 그 기억들을 현재에 재현했다.
재료의 물성과 화려한 색채, 경쾌한 ‘색채조각’을 선보이던 작가 최성철의 변화는 과거와 이어진 현재, 현존하는 우리의 삶에 녹아들었다. 등신대 높이 인물조각은 홀로 서 있기도 하고, 무리를 지어 있기도 하다. 한번의 시선으로는 읽히지 않는 표정과 명상적인 자세로 선 개개의 형상은 쉽게 물성이 파악되지 않고 모노톤의 색으로 뒤덮혀 있다.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는 형상들은 절제된 하나의 선들이 닿지 않게 흩어진 듯 고독한 개인들의 무리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편, <광화문> 연작은 외양상 앤터니 곰리(Antony Gormley)의 작품과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곰리의 조각, 즉 ‘육체사진(corpograph)’은 자신의 몸을 본뜨기 위해 곰리의 육체가 머물렀던 하나의 장소이자 공간으로 이해되는 ‘육체’, ‘거기 있었던’ 육체라는 특수한 대상에 생각을 집중시키게 한다. 실제 사람의 몸을 통해 얻어진 형상은, 그것이 만들어지기 위해 점유되었던 공간과 시간을 모두 담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표정 없이 조용하게 서 있을 뿐이다. 하지만 최성철의 형상들은 다른 기억과 시간을 담고 서 있다. 그가 빚어낸 몸은 실제의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시간과 기억을 형상화한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육체 자
체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광화문광장에 새겨진 서로 다른 시간, 그리고 그곳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기억들이 담긴 형상들은 온전하게 고독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모두 다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서 혼자라고 느꼈을 때 문득 고개를 들어보면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고독한 걸로 따지자면 곰리의 형상이 더 고독하다. 곰리의 형상 조각은 다수일 때에도 혼자라고 느껴진다. 다수의 형상이 늘어서 있을 때조차 곰리의 조각들은 한 방향을 응시한다. 그렇지만 그 형상들이 정확히 어디를 보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한 방향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물론 삶의 방식, 같은 공간을 기억하는 방식이나 경험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 공간에 ‘실존’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 군중은 익명으로 치환되기도 하지만 각각 ‘현존’하는 존재들이다.
군중을 이루는 우리는 모두 ‘실존이라는 보편성’과 ‘개인의 개별성’이 교차되는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곰리와 최성철의 조각이 외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존재’의 위치와 나아가는 방향은 매우 다르다.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l'existence précède l'essence)”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존재해야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해야 한다(Pour penser, il faut exister)”는 데카르트의 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선 존재해야 하고, 본질(본성)을 알려면 우선 존재해야 한다는 말은 다르지 않은 것이다.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각각의 존재들, 그들 안에 본질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며 이미 우리의 본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이 의미를 파고들어 예술의 본질을 구하기보다 실존에, 현재를 살아가는 삶에 집중하고자 했다. 예술의 본질을 찾아 천착하던 시
간을 지나 복잡한 인간들의 삶 속으로 들어온 그는, 오히려 창작하며 예술에 본질을 자각했다.
사실상 본질을 찾는 것에서 실존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실존을 통해 본질을 인식한 것이다. 그렇게 변화는 많았지만 다르지 않은 자신을 확인하며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작가 정체성을 지켜내고 있다. 정제된 사고에서 나온 정제된 형상, 정제된 색채가 주는 효과는 감정이입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 바라볼 때 익명의 조각 군중은 공간을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의 기묘한 광장으로 바꾸어 놓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키리코의 그것처럼 마냥 스산하고 불안하지만은 않다.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사물들이 단순히 어떤 장소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공간이 된다(『예술과 공간』, 1969).”고 한 바 있다. 조각은 공간을 점유하고 공간 자체가 되어서 조각이 속한 곳을 새로운 곳으로 변모시킨다. <광화문> 연작은 공간을 점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간의 기억을 공유하며 겹쳐진 시간으로 가득 채우 고, 그곳을 다차원으로 바꿔놓는다. 그 안에서 ‘흘러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 사라진 풍경에 대한 서운함,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일상에 대한 그리움과 같은 복합적인 감정들’이 드러난다. 이러한 감정들을 담고 있는 형상의
표정들, 무거운 작업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그 표정들은 작가의 얼굴이자 대중이라는 익명을 획득한 우리 각자의 얼굴이기도 하다. 이렇게 형상들에서 우리의 표정을 읽어낼 때, 공간은 기묘한 스산함이 아니라 친밀성으로 다가온다. 의도적으로 감정을 이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들 중 하나는 아마도 나의 모습일 것이다. 광장을 가로지르면서 지나는 사람들과는 그다지 눈을 마주치지는 않는, 무언가 바쁜 일이 있는 듯 광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나는 문득 ‘군중 속 하나’라는 익명성을 지닌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군중이란 것은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심리적으로 혼자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광화문> 연작의 형상 중 하나를 나로 생각해 본다면, 나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 누군가와 시공간을 나누고 있는 셈이다. 소리 내어 말할 필요가 없는 일종의 연대감이 내심 퍼지는 그런 시공간 말이다. 공감이란 것은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공감은 나의 실존을 타인도 가진다는 보편에서부터 출발한다. 보편성, 즉 실존을 인식하면 각자가 가진 개별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 ‘다름’에서 나오는 가지각색의 현상들을 이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같은 뿌리니까 다른 가지들이 나온 것을 아는 것이 공감인 것이다. 그래서 공감은 만들어 내거나 아는 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데 키리코의 광장이 주는 묘한 느낌을 좋아한다. 멀리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리지만, 결코 가까이서는 들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공간 말이다. 이런 공간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으므로 불안감을 자아낸다. 또 그림자도 제대로 드리우지 않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다. 그래서 차갑고, 기묘한 것이다. 하지만 <광화문> 연작의 형상들 사이에 있다면 사람들이 소리는 멀리 있을 것 같지 않다. 바로 뒤, 바로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묘한 불안감을 자아내지 않는다. 군중 속에서 고독한 것 같다고 느낄 때도 나는 군중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누군가와 시선이 얽히면 함께 새로운 기억을 쌓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데 키리코의 광장은 <광화문> 연작의 형상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의 친숙한 공간, 광장이 더 잘 들어맞는다. 왜냐하면 최성철의 형상들은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얼굴을,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가 보여주는 예술의 본질은 작품이 드러내는 온기에 있다. 물성은 단단하고 차가우며 어둡고 매끈하다. 그러나 작품이 품고 있는 이야기는 그립고, 아쉽고, 슬프거나 기쁜 온갖 감정들로 가득하다.
최성철의 <광화문> 연작은 작가 개인의 과거 기억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신의 실존을 확인하고, 다양한 삶의 실존으로 영역을 확장해 가는 작품이다. 이 연작이 과거의 기억을 중첩 시켰다고 해서 이 작품이 과거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를 현재에 드러냄으로써 앞으로 쌓여갈 시간이 만들어 낼 기억을 환대하고 있다. <광화문>은 작품이자 장소이고 기억이며 흐르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것이 우리 실존의 현장이고, 거기에 인간의 본질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의 본질이 예술의 창작 안에 내재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전시제목최성철: 광화문
전시기간2024.05.17(금) - 2024.06.15(토)
참여작가 최성철
관람시간10:00am - 06:00pm
휴관일일요일, 월요일 휴관
장르조각
관람료무료
장소본화랑 BON Gallery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299 지하1층)
연락처02-732-2366
Artists in This Show
본화랑(BON Gallery) Shows on Mu:um
Current Sh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