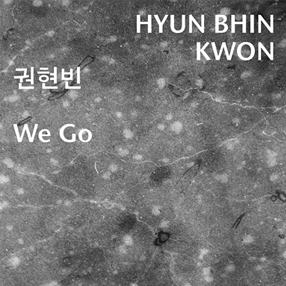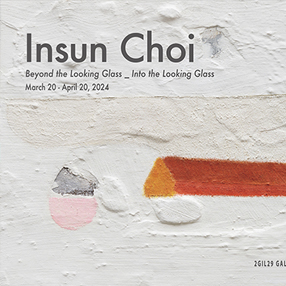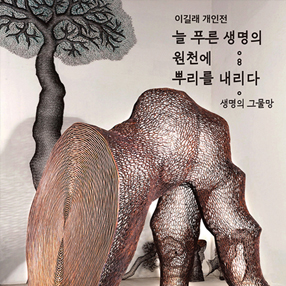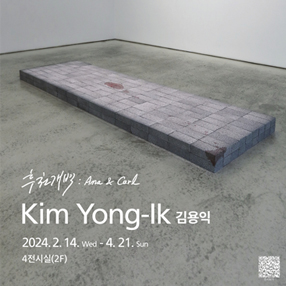본문
-
박영하
내일의 너 Thou To Be Seen Tomorrow 2016, 캔버스 위에 혼합재료 Mixed media on canvas, 260x182cm @제공 학고재
박영하
내일의 너 Thou To Be Seen Tomorrow 2023, 캔버스 위에 혼합재료 Mixed media on canvas, 182x228cm @제공 학고재
박영하
내일의 너 Thou To Be Seen Tomorrow 2023, 캔버스 위에 혼합재료 Mixed media on canvas, 131x163cm @제공 학고재
박영하
내일의 너 Thou To Be Seen Tomorrow 2023, 캔버스 위에 혼합재료 Mixed media on canvas, 131x163cm @제공 학고재
박영하
내일의 너 Thou To Be Seen Tomorrow 2023, 캔버스 위에 혼합재료 Mixed media on canvas, 163x131cm @제공 학고재
박영하
내일의 너 Thou To Be Seen Tomorrow 2023, 캔버스 위에 혼합재료 Mixed media on canvas, 163x131cm @제공 학고재
박영하
내일의 너 Thou To Be Seen Tomorrow 2023, 캔버스 위에 혼합재료 Mixed media on canvas, 112x112cm @제공 학고재
Press Release
내일의 너, 그 영원한 가능성
이진명 | 미술비평ㆍ미학ㆍ동양학
장자(莊子, B.C. 360?-B.C. 280?)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만물제동(萬物齊同)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만물제동은 “모든 것은 하나다(通爲一).”라는 뜻이며, 이 사상은 『장자(莊子)』의 「제물론(齊物論)」에서 자주 발견된다. 이는 “도에서 하나로 통한다(道通爲一).”라는 말이나 “만물과 나는 하나다(萬物與我爲一).”라는 말과 같다. 이러한 도리를 얻기 위해서 “천지자연의 밝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상(莫若以明)”이며, 반드시 “천지자연에 비추어보아야 한다(照之於天).” 그 도리를 얻고 나면 “자연의 균형에서 쉬게 된다(休平天均).” 그리고 그러한 진리는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어서 “그 대립의 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莫得其偶).”
그런데 듣기에나 좋을 이러한 말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우리는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터지고, 브라질에서는 가뭄으로 커피콩 수확이 줄어들고, 로테르담에서는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의회의 조제약 가격을 규제하는 새 의료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국의 무역적자는 신기록을 세운다.”라는 주식에 관한 저명한 저서의 첫 구절처럼 살아간다. 그야말로 혼돈 자체이다. 그런데 장자를 지금 여기에 데려와서 저 문장을 읽게 하면 그는 어떻게 대답할까? 다음과 같이 대답할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채 등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전쟁 종식 후를 대비하여 건설주와 철근과 시멘트 등 현물 투자할 생각은 당분간 지양할 것이며, 차라리 브라질의 날씨를 관찰하여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비가 오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야 할 것입니다. 조제약 가격이 고정되었으니 차라리 보험 회사에 투자할 것이며, 유가가 오르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각해지니 미국은 군수산업을 일으킬 것이고 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철근이나 시멘트에 대한 투자나 건설회사 주식 매입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장자는 “책과 미디어를 버리고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천지자연에 마음을 비춰보아야 합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화가 박영하(朴永夏, 1954-)가 그리는 세계가 바로 그와 같다. 박영하 작가는 온갖 이론과 설명이 설명이 넘쳐나는 복잡한 미술현상에서 본연으로 돌아가 회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인식과 삶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작업을 지속한다.
박영하는 1954년생으로서 1980년대부터 한국현대미술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화가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었던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1987년도에 특선을 했고, 이듬해에는 대상을 수상했다. 박영하가 추구하는 추상회화는 우리의 정서와 미감을 응축한 한국적 추상회화이다. 여기서 한국적 추상회화라는 뜻은, 조금은 특수한 뜻으로서, 화가의 말처럼 “자연 그대로의 색과 자연적으로 생겨난 흔적들과 유사한 표면의 느낌을 발견하여 화면에 구축하려는 의지를 담은 그림”이다. 실제로 작가는 산과 들에서 만나는 온갖 자연 대상과 바람과 빛과 소리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화에 담고자 한다. 그것은 명료하게 드러나서 이미 알려진 대상이 아니라 문득 예기치 않게 발견된 진리의 흔적이다.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연 그대로의 색과 자연적으로 생겨난 흔적들과 유사한 표면의 느낌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나의 중요한 작업과정이다. 소박하면서도 자유롭게 숨 쉬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평면이 되고자하며,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끈질기게 추구하고 소원해온 회화적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서구 문화는 죽음에 취해 있다. 밀레니엄이라는 폐쇄의 느낌은 도통 사그라지지 않은 채 여전히 방향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 주지와 같이 지난 세기에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1924-1998)는 이념의 죽음을 말했고, 다니엘 벨(1919-2011)은 산업사회의 종말을 철학적 의제로 선택했다. 롤랑 바르트(1915-1980)는 저자의 죽음을 말했으며, 미셀 푸코(1926-1984)는 인간의 죽음을 외쳤다. 심지어 알렉상드르 코제브(1902-1968)는 역사의 종언을 말했다. 모더니즘의 논의도 당연히 죽음의 논의를 비껴가지 못한다. 우리 동아시아에는 무시무종(無始無終)을 이야기한다. 우주의 본래 이치인 대아(大我)와 심체(心體)는 시작도 끝도 없이 항상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서 서구는 모든 것을 유한의 한계 내에 가두어 사유한다. 시간을 유한하게 바라보는 관점은 역사에 목적이 숨어있다는 믿음에서 비롯한 것이다. 가령, 이스라엘의 역사는 약속의 땅을 뜻하는 에레츠 이스라엘(Eretz Yisrael)이 역사의 목적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축복이며,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나 사는 것이야 말로 극형(極刑)이다. 전자를 알리야(Aliyah, ascent)라 부르며 후자를 예리다(Yerida, descent)라고 한다. 알리야가 실현되면 역사는 끝난다.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1770-1831)에게 역사는 절대정신의 실현과정이다. 절대정신이 이르면 역사는 종국을 맞이한다. 칼 마르크스(1818-1883)에게 역사는 인민의 투쟁이다. 인민이 더는 싸울 필요도 없이 자유를 얻으면 역사는 마지막 페이지를 끝맺게 된다. 이때 모든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없이 “아침에 사냥하고 오후에는 낚시를 즐기며 저녁에는 가축을 키우고 저녁 식사 후에는 비평을 한다. 엽사나 어부, 목동이나 비평가가 되는 일 없이 말이다.”라고 말했던 마르크스의 예언을 누리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르조 바자리(1511-1574)는 그림의 역사가 정확한 재현을 성취할 때 종국에 이를 것이라고 보았으며, 클레멘트 그린버그(1909-1994)는 모더니스트 회화의 역사를 더는 환원될 수 없는 회화의 독자성(irreducible unique), 즉 평면성(flatness)의 본질이 확연히 드러나는 과정으로 이해했다. 역사는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이야기의 서사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의 엔드(end)는 종국이자 목적이다.
동아시아의 역사의식에서 목적이나 네러티브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학자들은 역사에 실존했던 대동(大同)이나 요순의 재현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예술도 사명감으로 이해했다. 이것이 천명의식(天命意識)이다. 동아시아의 예술은 네 가지 단계로 나뉘게 된다. 그것은 죽음의 과정이 아니라 삶의 과정으로서 자(疵)․온(穩)․순(醇)․화(化)의 단계를 거친다. 동아시아에서 글씨나 그림, 문학은 모두 이 네 경지의 점진적 이동을 지향한다. 갑작스러운 돈오(頓悟)는 종교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천재라 할지라도 예술 속에서는 단계를 거친다. 처음으로 예술을 배울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붓이 움직이지 않는다. 글쓰기나 그림이 불능자여(不能自如)하다. 글씨의 결체(結體)가 단정하지 않으며 고르지도 않다. 왜곡되거나 잡박불순하다. 이를 자경(疵境)이라고 한다. 모든 사람은 이 단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부적 재능을 부여받고 태어난다. 그 사람이 근면하게 글쓰기를 실현하면 보통사람과 다른 글씨를 쓰게 된다. 더구나 옛 서보(書譜)와 비첩(碑帖)을 연구하여 임모(臨摹)를 진행하면 붓의 운용이 비교적 순조롭게 된다. 글씨나 그림이 평정(平正)하며 짜임새를 얻은 [工穩] 경지인바 이를 온경(穩境)이라고 한다. 이러한 글씨와 그림은 규범과 법칙에 부합된다. 그런데 여기에 심금을 울리는 무언가 정취가 없다. 독창적 오리지널리티가 없기 때문에 심금을 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글씨나 그림을 배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각 시대의 비판첩찰(碑版帖札) 등 모든 글씨와 역대 화보(畵譜)의 장점을 모두 종합하여 연구하여 자기의 길을 닦은 사람은 자기만의 풍격을 이루게 되는데, 글씨와 그림이 자유(自由)를 얻게 된다. 스스로 원하는 바에 말미암아 예술이 풍격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순경(醇境)이다. ‘순(醇)’이란 진한 술을 뜻한다. 진국이다. 동시에 변치 않는 순수함을 뜻하기도 한다. 어떤 글씨는 메말랐으며 어떤 글씨는 비대하다. 어떤 것은 습윤하며 어떤 것은 갈필이다. 때로는 기이하며 때로는 바르다. 이를 서예의 대이론가 포세신(包世臣, 1775-1855)은 “가품(佳品)” 혹은 “능품(能品)”이라고 칭했다. 그러나 지극히 아름다운 작품도 궁극적인 경지에 다다르지 못한다. 아직 장(匠)이라는 범주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장의 범주에서 해방되려면 예술가가 모종의 사상을 품고 있어야만 한다.
예술가에게 사상이란 거창한 철학이 아니다. 자기가 살아 숨 쉬는 시대와 사람들을 위한 애착과 진리의 발언을 뜻한다. 그 진리와 아름다움이 갈마들어 성숙될 때 비로소 화경(化境)이라 할 수 있다. 학문과 수양이 성숙된 뒤 기술과 용법의 모든 규모를 초월할 때, 화경의 진리가 펼쳐진다. 화경을 소유한 예술가들은 은일(隱逸)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이 이합하는 정조를 함께하기도 하며(인문을 즐기며), 산천풍운(山川風雲)의 자연을 사랑하는 동시에, 죽는 날까지 철학적 사유에 자신을 담금질한다. 이러한 격조가 글씨나 그림의 행간에 스며들게 된다. 이를 포세신은 “신품(神品)”이라고 말한다. 글씨로 치면 왕희지(王羲之, 307-365)의 <난정서(蘭亭序)>가 신품이며, 시로 치면 초나라 굴원(屈原, B.C. 343?-B.C. 278?)이 지은 장편 서정시 <이소(離騷)>가 신품이다. 소식(蘇軾, 1036-1101)이 지은 <제서림벽(題西林壁)>이 있는가 하면,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부작란도(不作蘭圖)> 역시 신품이다.
박영하는 어린 나이에 자경을 벗어날 수 있었으며, 온경의 경지에서 화단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화무쌍한 대자연의 숨결을 느끼고서 예술의 자유를 생각하게 되었다. 발견(發見)은 영어로 디스커버(dis-cover)이다. 말 그대로 이불을 걷어치운다는 뜻이다. 습관은 솜이불과 같다. 날카로운 구석을 감싸며 잡음을 줄여준다. 그것은 지각을 마비시킨다는 의미에서 비미학적(unaesthetic)이다. 그 말의 어원인 그리스어 ‘aithesthai’가 지각이라는 뜻에서 그렇다. 이불은 구석이나 소음과 같은 정보를 차단한다. 따라서 모든 것이 편안하다. 습관은 모든 것을 편하고 조용하게 한다. 주위의 편안한 모든 것은 정취 있게 다가온다. 정취는 조국과 관련된다. 그런데 솜이불을 들추어내면 정취는 사라지고 고통이 다가오게 된다. 이때 사물의 진상이 발견된다. (dis-covered) 이불이 들추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안하다. (un-settling) 발견은 그리스어로 망각(습관)의 강을 건너서 이제는 본래 정신으로 돌아온 ‘aletheia’이며, 따라서 이는 진리로 번역된다. 박영하는 1990년대 한국현대미술화단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온경의 경지에서 만족하지 않고 낯선 오스트레일리아로 활동무대를 확장했다. 그곳에서 낯선 풍경과 문화,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Australian Aborigine)의 태고의 회화는 서구 현대미술이나 동아시아에서 볼 수 없었던 자유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얽매임도 목적도 없었다. 자유로운 유희이면서도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의식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대대(對待)가 없는 경지였다. 작가가 그동안 싸매고 있던 솜이불은 마침내 들춰졌다. 내가 나일 수 있었던 내가 사라졌다. 작가는 우리나라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오가며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느낄 수 있었다.
세상을 나의 기준과 나라는 관념에서 바라보면 진리일 수 없다. 그것을 이아관물(以我觀物)이라고 한다. 세상을 사물의 관점에서, 사물의 본성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물관물(以物觀物)이라 한다. 이 둘에 관해서 말해준 사람이 소옹(邵雍, 1011-1077)이다.
세상을 사물의 본성으로 바라보는 것은 성(性)이다. 세상을 나의 기준에 다라 보는 것은 정(情)이다. 성은 치우침 없이 밝고, 정은 치우치고 어둡다.
이물관물은 사물의 본성에 입각하여 사물을 비추는 것이다. 본성[性]의 객관적 증험이 이루어진다. 이아관물은 주관적 의식과 바람으로 사물을 응시한다. 이때 걸러지지 않은 감정[情]이 체현된다. 이아관물에서 비롯한 회화작품은 주관 의식의 격정이나, 아니면 무의식의 심연에서 건져 올린 우연에 기대게 되기 때문에 편파적이며 어둡다. 소옹은 “나로써 사물을 대하지 않으면 사물로써 사물을 대할 수 있게 된다. 나에게 맡기면 정이 일어난다. 정이 일어나면 폐단이 생기고 폐단이 생기면 어두워진다. 사물에 인하면 성이 드러나고 성이 드러나면 신과 회통하니 밝아지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소옹은 나의 감정에 맡겨두는 것을 임아(任我)라고 했다. 이에 반해 인물(因物)은 사물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예술가는 임아의 관점에서 끝난다. 그러나 인물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다시 회화의 역사를 보고 다시 자기를 심리적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경지이다. 즉, 소옹은 보는 것에는 세 가지 층위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눈으로 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치로 보는 것이다. 박영하는 추상회화의 이치로 사물의 진리를 발견한다. 가장 자연스러운 경지를 추구하며 바람의 흔적, 소리의 자취, 시시각각 갈마드는 빛과 그림자의 유영을 나타낸다. 동식물의 자연스러운 정취를 나타낸다.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서로 통하는 경지이다. 따라서 박영하의 회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편견이나 습관, 자아를 강조하지 않고 사유를 위한 사유마저 지양하여, 통일된 경지로서의 자연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인물(因物)의 회화인 것이다. 나아가 최종적으로 소옹은 사물을 바라보는 최고의 경지를 가리켜 반관(反觀)이라고 했다.
거울의 능력이 사물을 밝힐 수 있음에 있음인 바 그것의 능력은 만물의 형태를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거울이 만물의 형태를 숨기지 않는다 해도 물의 표면이 만물의 형태를 하나로 드러내는 것만 못하다. 그러나 물이 만물의 형태를 드러난다고 해도 성인이 만물의 정을 하나로 드러내는 것만 못하다. 이는 성인의 반관으로 살펴볼 수 있는 능력에 비롯한다. 반관으로 살핀다는 것은 나로써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다. 나로서 사물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사물을 사물로서 바라보는 것이다. 사물로 사물을 바라보니 그 사이에 어찌 내가 자리할 수 있겠는가? 이는 내가 타인이며 타인이 곧 나이고 나와 타인 모두 사물임을 아는 지혜이다.
옛날에 사용했던 동거울은 반관의 뛰어난 예시이다. 그러나 만물의 윤곽만을 드러낸다. 물은 보다 명료하게 사물의 형상을 드러내는데 만물의 외형만을 비출 뿐이다. 성인의 심경은 만물의 모든 사정을 비춘다. 이는 주관적 정감이 아니다. 이는 무아(無我), 그리고 나와 만물이 하나가 되는 경지(齊我與萬物而爲一)에서 가능한 경지이다. 내가 사물이고 사물이 나인 경지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다. 소옹 역시 “역지이처(易地而處), 즉 서로의 처지를 바꾸면, 곧 무아의 경지에 돌입할 수 있다(則無我也).”라고 말한다. 박영하의 회화는 화가라는 대아(大我)를 덜어내 자연과 사건, 즉 사사물물(事事物物)에 합일되어 자연의 자취를 회화에 담으려는 영원한 기획이다. 따라서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에게 있어 추상회화는 무한한 자유와 새로운 발견이다. 비형상적인 형태 사이의 시각적 긴장, 색채, 질감, 움직임, 축적되어가는 과정, 모든 것들이 화면을 만들어낸다. 이미 나타난 것이 아닌, 나타내려는 하나의 발견을 기대하며 각기 새로운 작업에 임하는 동시에 원초적 숨결로서의 평면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나의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색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자연이다.
다시 장자로 돌아와서, 「제물론」에는 “기분야, 성야(其分也,成也). 기성야, 훼야(其成也, 毀也).”라는 말이 등장한다. 풀줄기처럼 약한 것과 큰 기둥처럼 강한 것, 문둥이처럼 추한 사람과 서시(西施)처럼 아름다운 미인을 들고 또 세상의 온갖 이상한 것들[恢恑憰怪]에 이르기까지 도리[道]는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한다. 하나인 도리[道]가 분열하면 상대세계의 사물이 성립하고, 상대세계의 사물이 성립되면 그것은 또 파괴된다. 따라서 모든 사물은 성립과 파괴를 막론하고 도리에 의해 다시 통해서 하나가 된다. 오직 통달한 사람이라야만 통해서 하나가 됨을 안다. 이 때문에 인간 세계의 습관이나 편견을 쓰지 않고, 용(庸), 즉 상주불변(常住不變)의 자연에 모든 것을 맡긴다. 용(庸)이란 작용이고, 작용이란 통함이고 통함은 자득함이니 자득의 경지에 나아가게 되면 도리[道]에 가깝다. 절대의 시(是)에 말미암을 따름이니 그렇게 할 뿐이고 그러한 까닭을 알지 못하는 것을 또 도리[道]라고 부른다.
박영하 작가의 회화 속으로 언뜻언뜻 비추는 크고 작은 형상은 풀(莛)을 연상시키고 기둥(楹)을 연상시킨다. 그 속에는 훼궤휼괴(恢恑憰怪)의 온갖 형상이 현미무간(顯微無間)을 이룬다. 박영하의 모든 회화 작품 속에는 장자와 혜시(惠施, B.C. 370?-B.C. 309?)가 논했다는 물고기[鯈鱼]의 진정한 자유가 담겨있다. 따라서 박영하 작가는 주어진 천명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림을 통해 발견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순수함과 자연스러움의 발현 과정인 ‘내일의 너’를 인류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박영하 작가는 순수한 자연에 모든 것을 맡길 줄 알며 나라는 시름을 잊어버린 진정한 자유에서 새로운 회화가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시제목박영하: 내일의 너
전시기간2023.05.17(수) - 2023.06.17(토)
참여작가 박영하
관람시간10:00am - 06:00pm
휴관일매주 월요일
장르회화, 드로잉
관람료무료
장소갤러리 학고재 Gallery Hakgojae (서울 종로구 삼청로 48-4 (소격동, 학고재) 학고재 신관)
연락처02-720-1524
Artists in This Show
갤러리 학고재(Gallery Hakgojae) Shows on Mu:um
Current Shows